어린 아내와 자녀들 숨막히는 하루하루 노심초사
光復團 결성하고 혁신단 조직하며 무력투쟁 도모
‘기독교인 대학살’ 美의원단 訪韓…거사 사전발각
상해로 망명 다시 한국에 ‘임시정부 물심양면 도와’
동지와 폭탄제조 일원이 密陽署투척 경찰서장 중상
 | ||
| @Newsis | ||
그들의 역사책 첫 페이지에는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로 시작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핍박한 민족을 용서하라! 그러나 그 수치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가 역사를 잊는다면, 그런 수모를 다시 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철저히 조상들의 비참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역사시간도 철학시간도 없어져 2세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재산도 없다’
한반도를 일본에 빼앗긴 1900년도 초, 당시에 깨어있는 종교인들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있었기에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청년 김상옥도 동대문 교회의 손정도 (孫貞道, 1882-1931) 목사에게 독립정신을 배웠으며, 누구보다 애국정신이 투철하여 이미 일본에 빼앗겨 버린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고 있었다.
후일 손정도 목사는 목회자가 아닌 독립운동가로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청년 김상옥은 일제의 국권탈취와 탄압,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새벽이면 맞은편 서울의 좌청룡 낙산(駱山)에 올라가 쌍(雙)소나무 위에 거대한 태극기를 몰래 매달아 놓고, 아침이 되면 아내와 직공들에게 보이며, “저 낙산에 태극기가 꽂혀 있으니 곧 독립은 되고 말거요!”라고 외쳤다.
그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무렵에는 남산(南山)과 인왕산(仁王山) 등에도 일경(日警) 몰래 태극기를 꽂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나눠줄 태극기를 인쇄하였다.
“독립운동가의 집안은 삼대가 망한다!”는 말은 예삿말이 아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운동을 하러 나가는 아들 손에 쥐어진 태극기를 보면서, 그의 어머니 김점순은 나라 사랑과 자유 독립을 애타게 그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남편을 닮은 아들의 남자다운 그 모습을 속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깊은 뜻을 헤아렸기에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이십대의 어린 그의 아내 정진주는 남편이 태극기를 꽂고 내려오는 날이면, 온종일 가슴을 졸이며 어린 아들과 딸을 품에 안고 떨어야 했으며, 언제 시커먼 발로 집 문을 부수고 쳐 들어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모르는 일경이 무서워, 밤낮으로 방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뛰고 놀고 싶어 하는 어린 두 자녀들에겐, “조용히 해라! 언제 일경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방안에서 나오지 말고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라!”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집안이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생각으로 식구들도 돌볼 틈을 갖지 못하고 온종일 독립운동에 젊음과 온 재산을 던졌다.
평소에 김상옥의사의 우국충정을 목격한 유광렬(柳光烈) 前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 무렵 동대문 근방에 흰 말총 모자를 쓰고 힘차게 그리고 분주히 걸어 다니는 단단한 체구의 키 작은 신사! 그에게서는 언제는 불타는 민족애와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었으니, 이가 후일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삼판동(現 후암동)에서 단병접전(短兵接戰)으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김상옥 열사인 것이다”라고 회고했다.(韓國日報 1962年 1月 12日字)
● ‘광복단’ 결성하고 물산장려운동 앞장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이름) 이래 더욱 강화된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해졌다.
이에 청년 김상옥은 지방을 두루 돌면서, 나라를 송두리째 삼킨 일제가 저지르는 토지 수탈, 시장독점 등은 심각한 횡포를 직접 목격하고 독립심을 더욱 세웠으며 이에 대한 실행 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약장수 행상을 하며 독립 자금을 마련하면서 기독교 전도와 민족의식을 깨우는 ‘장터의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한편 뜻을 같이할 동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3년에는 경상도 풍기(豊基)에서 채기중(蔡基中)을 비롯한 의병 동지들을 만나 ‘광복단’(光復團)을 결성하고 1916년 5월에는 한훈(韓焄)·유장렬(柳章烈), 곽경렬(郭京烈) 등 의병 출신들과 함께 전라도에서 친일민족반역자 서(徐)모 외 수명을 총살하고, 모 헌병대분소(烏城憲兵隊分所)를 습격하여 장총 3정과 군도(軍刀) 1개를 탈취하였다.
김상옥의사는 광복단의 일원으로 독립운동 뿐 아니라 사업가요 교육가의 기질도 충분히 발휘했다. 그는 일본제품이 물밀듯 들어와 비싼 가격으로 강매되어 고통에 시달리는 민족을 위해 손수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물산장려 운동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혼자의 힘으로는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1917년 이종소(李鍾韶), 임용호(任龍鎬), 손정도(孫貞道), 김동계(金東桂) 등과도 만나 사회계몽 및 독립에 대한 일들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백영사(白英社)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아직 미개한 서민을 향해 일어(日語) 사용금지, 금주(禁酒) 및 금연(禁煙)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 일도 담당하였다. 백영사 태동을 약술하면 이렇다.
특히 장지영(張志暎)은 물산장려운동에 더해, 보다 적극적 독립운동방안을 모색하는데, 그는 이수삼· 백남일· 조규수· 김정섭· 정범진· 노대규· 이원행· 오의선· 홍덕규· 김용철 등과 혈서동맹을 하여 비밀결사대인 ‘흰얼모’를 조직한다. 그 활동을 상하이 임정과 연계하기 위해 ‘흰얼모’ 이름을 백영사(白英社)라 하여, 해외 독립운동 동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독립운동은 점점 국제적 연대와 공조의 성향이 뚜렷해진다. ‘노동사회개진당(勞動社會改進黨)’의 창립이 바로 그것이다. 잠시 그 태동 배경을 살펴본다.
제1차 세계대전 뒤 국제사회당(國際社會黨)은 약소민족들을 결합해 세계인민연맹(世界人民聯盟)을 결성하기 이른다. 1919년 8월 네덜란드에서 개최한 준비대회에서 대한독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승인하였는데, 대회에 참석한 임시정부의 조소앙(趙素昻)은 희소식을 재미 한국인에게 전달하면서 외교활동 자금을 부탁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19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 이순기(李舜基)· 이살음(李薩音)· 임일(任日)· 김호(金乎)· 이범영(李範榮)·김여식 등이 발기해 조직하였다. 로스엔젤레스에서 勞動社會改進黨은 月報 ‘동무’를 創刊하였는데, 주필은 이살음(李薩音)이었다.
앞서 약술한바, 손정도목사는 동대문 교회 담임목사였으나,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현 국회격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 혁신단(革新團) 조직하고 革新公報 발간
김상옥의사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날 평화시위 독립운동을 잘 준비하였다. 그래서 아침부터 공장 문을 닫고 태극기 모형을 고무판에 새겨서 준비한 백지에 수백 장을 찍었다. 그는 직공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도록 지시하고, 모두 함께 파고다 공원에 참석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하였다.
오후 5시가 되어 일본인 경찰과 헌병들이 일제히 만세 운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한 일본 헌병이 만세를 부른 여학생을 추격하여 장칼로 막 찌르려는 광경을 김상옥의사가 목격하였다. 원래 담대하고 몸이 날쌘 그는 순간 비호처럼 달려들어 헌병을 내리치고 장칼을 빼앗고는, 여학생을 구해주었다. 이 장검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김상옥의사는 이제 우리가 일제에 항거하는 방법이, 3.1운동 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만으로 독립을 꿈꾼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오직 태극기만을 손에 들었으나,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과 칼로 내리치며 우리 민족을 목숨을 짐승처럼 죽이기 시작했다. 평화적 시위로는 나라의 독립을 꿈꾼다는 것은 단지 몽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김상옥의사는 더 강한 방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상옥의사는 3.1운동 직후 평소 교분을 쌓아왔던 청년학도들인 박노영(朴老英)· 윤익중(尹益重)· 신화수(申華秀)· 정설교(鄭卨敎)· 전우진(全宇鎭), 이혜수(李惠受) 등과 동대문교회 내의 영국인 피어슨여사 댁에서 비밀결사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기관지이자 지하신문인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하여 항일독립의식과 민족계몽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며 시민에게 배포되던 혁신공보가 일본에 빌붙은 무뢰배를 일컫는 ‘부일배(附日輩)’ 한국인 형사 김창호에게 발각된다.
혁신공보는 압수되고 김상옥의사는 체포되어, 독립 운동가들을 악독하게 고문하기로 유명한 종로경찰서에 구금되어 40일간 심한 고문과 고초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문 중에도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여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며,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는 날, 동지들을 만나 다시 혁신공보를 계속 발간할 것을 부탁하고 새로운 등사기를 사온 것을 보고서야 집으로 가는 열의를 갖았다.
그 시기의 혁신공보의 존재는 뚜렷해졌으나, 반면 재정난이 심해져서 김의사와 동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바쳤으나, 날로 심해져만 가는 일본경찰의 감시로 인쇄와 배달이 어려워져만 갔다.
김상옥의사는 이제 이런 우리 민족만의 미온적인 투쟁방법, 즉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법이나 혁신공보등 신문이나 글만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꾼다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무력의 투쟁방법을 하여 큰 사건을 일으키므로, 해외에서 왜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일본에 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여론을 일으켜, 세계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힘없는 작은 나라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하는 구체적 방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그는 1920년 1월, 혁신단 동지들과 함께 암살단을 조직하고, 일제 총독 및 고관을 비롯하여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운다. 김상옥의사는 중앙청년 체육회, 애국부인회, 대동단((大同團) 등과도 연락하여 협동작전을 펼치면서, 때마침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만주 길림군성서(吉林軍政署)로부터 온 청년 김동순(金東淳)과 함께 독립군과 연계된 공동투쟁을 모색하게 된다다. 참조로 대동단은 1920년 2월 전협(全協)·최익환(崔益換) 등이 서울에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다.
● ‘기독교인 대학살’ 美의원단 방한 ‘거사 모의’
1919년 4월 15일 아리다(有田俊史) 일본 육군중위가 이끄는 한 무리의 일본군경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수원 제암리(堤岩里)에 와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약 30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을 폐쇄하고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이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밖으로 내놓으며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일본 군경은 아기마저 잔혹하게 찔러죽이고 말았다.
이 같은 만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본군은 교회당에 불을 질렀으며, 바깥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에 타죽게 만들어 무고한 양민 28명을 학살하고, 다시 인근의 채암리(采岩里)에 가서 민가를 방화, 31가호를 불태우고 39명을 학살했다.
일제의 이같은 만행에 분노한 선교사 스코필드박사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일본군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보내 여론화했다. 1920년 8월, 기독교도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제의 만행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미국인 의원단이 국내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 방문 행사를 맞아 ‘총독처단과 총독부 폭파와 종로시가전’을 계획하고, 김상옥의사와 그 동료들은 사격훈련과 거사 당일 배포할 암살단 취지서, 통고문, 경고문등의 인쇄를 완료하며, 광복단 동지 한훈(韓焄)(후에 사돈이 됨)이 지휘하는 ‘결사대(決死隊)’가 준비한 무기와 트럭 3대를 동원하여 거사 준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재정을 맡은 윤익중(尹益重)은 ‘암살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골몰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 집을 저당 잡혀 당시에 거액인 일금 천여원을 만들었고, 이어서 김상옥의사도 동생 김춘원(金春園)을 시켜 자신의 철물점을 담보로 이천원을 만들어 무기 등 거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때 저당 잡힌 김상옥의사의 재산은 그의 사후 경매처분에 이르러 결국, 가장을 잃고 난 그의 가족 13명은 길거리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된다.
이 엄청난 거사 계획은, 일본 경찰의 예비 검속에 노출되어 좌절되고 만다. 일경에 쫒기는 김상옥의사는 왕십리에 있는 김태현(金泰鉉) 목사의 집에서 잠시 숨어 지내다가, 일경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그리운 가족에게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1920년 10월 어두운 북쪽의 낮선 중국 상해로 망명의 길을 떠난다.
● 망명생활 귀감, 호연지기(浩然之氣) 몸소 실천
김상옥의사는 독립운동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한 것은 물론이고, 철종의 사위이며 개화파의 선구자인 박영효(朴泳孝)로부터 3천원을 조달하는 등 각 지방 유지들로부터 군(軍)자금을 모아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과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는 외로운 망명생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학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동서양의 새로운 사상을 배워 누구와 만나든지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 갔다.
특히 삼민주의(三民主義), 오권헌법(五權憲法), 국제노동운동개요, 자본론입문, 근대과학과 무정부주의, 아국혁명기(俄國革命記), 조선혁명선언급한살임정강(朝鮮革命宣言及韓薩任政綱)등을 탐독하며 지식을 넓혀나갔다.
뿐만 아니라 각국 지사들의 토론대화에도 참석해 독립혁명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뚜렷이 발표해 갈채를 받았으며, 선배 독립투사들과는 밤을 세워가며 나라를 위한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먼 타국에서도 동족간의 불화는 있었다. 힘겹게 세워져가는 임시정부를 와해하려는 일본 앞잡이의 매국노들을 볼 때, 김상옥의사는 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시영(1933년과 1945년 사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부통령을 지냄) 등에게 그들을 처단하자고 상의하였으나, 이시영은 “타국에서 동족상잔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간곡히 만류하여 그 일을 접기도 하였다.
망막하고 외로운 상해 망명시절 그를 반겨준 사람은 뜻밖에 조소앙(趙素昻)이었다. 조소앙은 김상옥 의사가 ‘말총모자’를 선물해준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중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조소앙의 형 조용하(趙鏞夏)가 쓴 ‘김상옥전’(金相玉傳)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昔余匿跡齋洞之薩音家金君相玉以白騣帽二見贈余與家弟素昻愛戴之爲其國産也...信其非常人也”(옛적 내가 재동 살음 집에서 은거할 때, 김상옥이 흰 말총모자 2개를 선물해 주었는데, 나와 아우 조소앙은 그것이 국산품이고 해서 아껴가며 즐겨 썼고... 김상옥 그는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믿었는데)
미국 의원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젊은 동지들이 용감하고 치밀하게 거사를 세웠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묻고 또 들으며, 조소앙은 감탄하며 “아, 국내 젊은 동지들이 이렇게 열렬한 분들이 계신 것을 몰랐다니 큰 죄를 지었구려!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손을 힘껏 흔들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였다.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 만두와 호떡을 사 주었다. 사실 그때 김상옥의사는 돈이 없어 3일을 굶어 지냈던 때였으니, 그 호떡의 맛이 어떠하였으랴! 그 후에는 김상옥은 몇 번이나 호떡에 대한 이야기를 동지들에게 들려주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가난에 허덕임의 비참함을 어찌말로 표현할까! 그러나 망국의 설움을 안고 바다건너 멀리 타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독립투사들의 살림도 찢어지게 가난하긴 마찬가지였다. 방세를 줄 돈이 없어 거처할 곳이 없어진 김상옥의사는 이리저리 쫓겨 다녔으며, 밥을 거르는 것은 예사였다.
한편 김상옥의사는 장개석 총통(蔣介石 總統)의 비서관이며 우리 정부로부터 1966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중국 명사인 진과부(陳果夫)를 비롯하여, 황개민(黃介民), 황능상(黃凌霜), 요천남(姚薦楠), 고진소(高振宵), 영소청(寧少淸), 동육화(董育華), 장추백(張秋白)등과 사귀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상해에서의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들은 후일 김상옥의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조문하는 글을 남겼고, 특히 진과부(陳果夫)는 “救國之仁”(나라를 구한 덕망 있는 인물)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한편, 백범 김구(金九) 선생을 비롯하여 이시영, 조완구, 조소앙등 임시정부 요인들도 깊은 애도의 글을 남겼다.
● ‘큰 뜻’ 다시 한국에…비호와 같은 무예연마
가난이나 배고픔도 김상옥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제에 허덕이고 있는 가여운 민족과 김상옥을 놓친 분풀이를 모진 고문을 식구들에게 자행할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꿈속에는 문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며 목 놓아 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시집와서 남편과 맘 놓고 대화 한번 하지 못한 가여운 아내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무서워 떨며 자라는 불쌍한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김상옥의사는 조소앙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원들, 김구(金九), 이시영(李始榮), 이동휘(李東輝), 윤기섭(尹琦燮), 조완구(趙琬九), 신익희(申翼熙) 그리고 김원봉(金元鳳)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1921년 7월 국내로 잠입에 뜻을 이룬다.
김상옥은 상해를 떠나면서 농부차림으로 변장하고 밤을 틈타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서 경비경관을 사살하였다. 신의주에 들어와서는 세관검문소 보초를 권총으로 머리를 때려눕히는 등 격투 끝에 국내 잠입에 성공하였다.
이후 김상옥은 망명지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져는 있었으나 심각한 재정난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처지이라 충청, 전라지방과 평양등지를 홍길동처럼 돌며 자금을 조달하여 그들의 생계를 도왔다.
송상도의 ‘기려수필’(騎驢隨筆)에 의하면, 1920년 11월에 김상옥의사는 이종암(李鍾岩), 배중세(裵重世), 고인덕(高仁德) 등과 함께 밀양의 한봉인(韓鳳仁) 집에서 비밀리에 폭탄 2개를 제조하고, 그 폭탄을 1920년 12월 27일, 밀양((密陽) 출신의 의열단원 최수봉(崔壽鳳) 선생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경찰서장에게 중상을 입힌 의거 결행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김상옥의사가 국내에 있을 때는 평소 체력단련을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낙산(駱山), 남산(南山) 북악산(北岳山) 등지를 번갈아 뛰어올라 다니며 체력과 담력, 무예 단련 등심신의 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습관적으로 방바닥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손의 힘을 단련하였는데, 이러한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얘야, 방고래 빠진다!’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매일 일찍 어딜 가는 거야. 에미가 불안하구나!’ 라고 말씀도 하셨다. 이런 주먹훈련과 단련으로 그는 돌덩어리 같은 주먹과 비호같은 몸놀림을 갖게 되었다.
상해 망명시절에도 무술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와 같이 다소 기이한 방법을 계속하였다. 여전히 방바닥에 헌 신문지를 두둑하게 깔고 그 가운데를 주먹으로 두들기며 다졌다.
한번은 조소앙 선생이 웃으면서 “김동지, 지금 뭐하는 거요?”라고 묻자, 김상옥은 빙그레 웃으며, “팔뚝 힘을 똑바로 길러 백발백중이 총 솜씨가 돼야 왜놈들과 싸워 이길것 아니겠오?”라고 하며 신문지 뭉치가 풀솜처럼 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그렇게 그의 사격솜씨는 백발백중이었는데, ‘리벌버 클럽’이라는 사격장의 미국 여주인은 ‘Very Good!'을 연발하며 김상옥의사 훈련을 도왔다고 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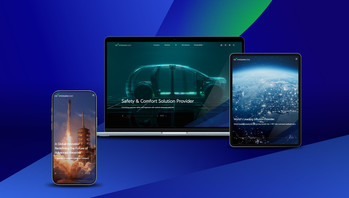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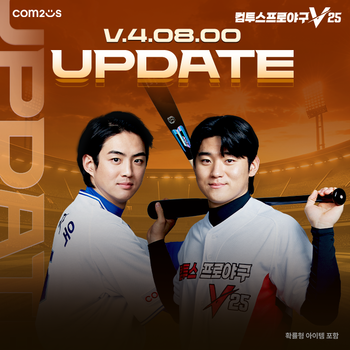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