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고
볕 좋은 날을 기다려
저수지로 향했다
비 오는 날이 많아
잡초만 앙상하니 길쭉했다
야트막한 밭담에 듬성듬성 뚫린 구멍
빈 곳마다 눌어붙은 바람의 무리
먼 길이 아닌데 자꾸 몸살이 왔다
양지바른 곳에 앉아 쉬었다
쉬면서,
겨울에 집에 두고 온 사진 몇 장을 생각했다
북쪽에서 박하 향의 은근한
빛이 자박거렸다
저녁 쓰르라미가 잠깐 울다 갔다
 |
| ▲ 이은화 작가 |
[일요주간 = 이은화 작가] ( 시 평론 )「저수지」의 배경이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풍경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움켜쥔 채. 다시 읽는다. 그는 “볕 좋은 날을 기다려 저수지”를 걷는다. 가벼운 외출인데도 자꾸 몸살 기운이 도는 날, 화자는 이 피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양지바른 곳에 앉아 쉬었다”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그리고 쉬는 동안 “겨울에 집에 두고 온 사진 몇 장”을 생각한다. 계절은 순환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시의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련함이 묻어난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거나,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시 봐야겠다고 미뤄뒀던 무엇처럼. 어떤 순간들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애틋하다.
이어 “북쪽에서 박하 향의 은근한 / 빛이 자박거렸다”며 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들려준다. 박하 향기는 차갑고 청량하다.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모순된 감각들이 “자박거리며”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삶도 그렇다. 기다렸던 것은 오지 않고 기대했던 것은 빗나가지만 그 대신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 시는 저수지를 걷는 이야기지만 실은 내면을 향한 여정이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가는 중이다.
걷는 길에서 때로는 몸살이 나거나 어제와 다른 풍경이 펼쳐지거나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쉬어도 된다고. 쓰르라미도 잠깐은 울다 간다고. 그 잠깐은 오히려 또렷하게 남는다고. 남아 뜨겁게 품은 것들을 말하지 않고도 더 잘 보여준다고.’ 혼잣말을 덧붙이며 읽는다. 볕 좋은 곳에서 쉬어가는 「저수지」의 풍경처럼 말이다. 그러니 삶에 지쳐 휴식과 치유가 필요할 때 잠시 쉬는 일도 괜찮다고.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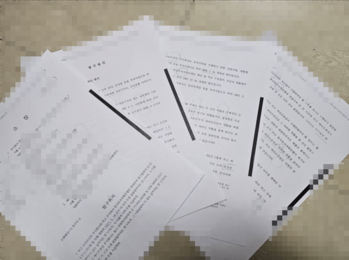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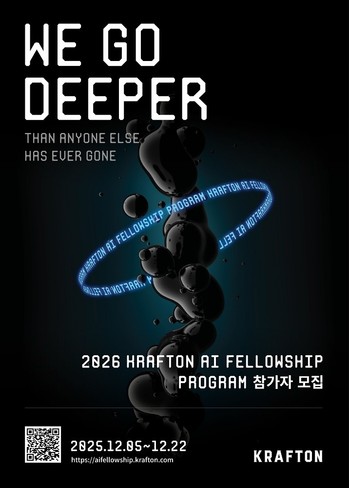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