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인생에서 음악을 발견했다.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등 서양세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들을 교과서가 아닌 소니 워크맨에서 발견한 것이다. 우연히 친구의 워크맨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아마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귀를 간질이고 또 귀청을 때리는 운명 교향곡과 장난감 교향곡 등의 아름다운 선율에 완전히 매료된 모양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삯바느질을 하는 어머니가 벌어주시는 학비로 형과 함께 단칸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던 그 친구는 워크맨을 살 형편이 못되었다. 이것저것 듣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선은 워크맨을 사야했고, 그 다음엔 그 테이프들을 사야했지만 돈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난 그 친구가 무슨 일이든 생각한 바를 꼭 이루려는 열정을 간직한 친구라서 소니 워크맨 하나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만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넘어선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그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자기가 친 큰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천도 크게 보았을 농촌 출신 그 친구가 어느 날 큰맘을 먹고 서울을 찾아갔다. 이유는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으로 워크맨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의 주머니에는 참고서를 사야 하는 돈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런데 책부터 사려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는 길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필이면 웅장한 세종문화회관의 자태였다. 이게 뭔가 하고 건물에 접근한 그의 눈길을 잡아 끈 게 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안내 포스터였다.
“이게 뭔가? 이게 말로만 듣던 뉴욕 필하모닉?” 호기심이 동한 친구는 별 생각 없이 매표소 직원에게 이런 거 한 번 보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다.
“공연 보는 데 얼마죠?”
“학생이 볼만한 좌석은 없어요.”
행색이 꾀죄죄한 내 친구를 아래위로 훑어본 창구 아가씨의 대답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학생석, 일반석, 특석 다 나가고 로얄석만 남았어요.”
촌놈을 홀대한다는 괘씸한 생각과 동시에 워크맨으로만 듣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거란 벅찬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게 싫어서 다시 말을 붙였다.
“아, 그 로얄석이라는 건 얼만데요?”
“제일 앞좌석인데요. 12만 원이요.”
귀찮다는 듯이 내뱉는 그 여직원의 눈앞에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종잇돈들을 내밀었다. 그 친구는 돈을 받아 쥔 그 여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 나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러나 빡빡머리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의 손도 많이 떨렸으리라.
그 친구, 워크맨은 커녕 참고서 살 돈까지 예상에 없던 비싼 문화생활 한 번에 다 털어 넣고는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당시의 그 돈은 그렇게 큰돈이었다.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공연의 로얄석 가격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질려버린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 그 공연을 제일 앞자리에서 들으니 어땠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는 당시의 감동을 다시 맛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아, 뭐...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게 워크맨으로 들을 때보다 더 귀가 간질간질하고 했지, 뭐...”
고음 부분에 귀가 더 간지럽고, 저음 부분에서는 가슴이 더 쿵쾅거리고... ‘에이, 겨우 그 정도의 차이를 감상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썼단 말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9시 뉴스 앵커가 됐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그 가난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상했던 뉴욕필하모니닉의 내한공연을 세종문화회관 4층 꼭대기 좌석에서조차 한 번 듣지 못했다. 대신 귀를 버렸다. 직업병을 얻은 것이다. 7시 뉴스 앵커, 8시 뉴스 앵커, 심야토론 앵커, 열린토론 앵커 생활을 하면서 귓속에 깊숙이 꽂았던 모니터용 리시버가 아마 문제였던 것 같다. 어느 순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싶었는데, 이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주 고음의 몇가지 소리가 ‘삐이~’ 하고 평소에도 계속 나의 귀를 괴롭힌다. 소음이 있는 낮 동안에는 괜찮은데 자려고 누운 고요한 밤에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건 아닌가 두려울 때도 있다.
문제는 그 고음의 소리가 평소에도 귀에 들리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의 고음을 잘 알아듣지 못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치읓’이나 ‘키읔’ ‘쌍시옷’ 같은 자음이 ‘지읒’이나 ‘기역’ ‘시옷’ 같은 발음으로 들릴 때가 있다. 물론 중증은 아니라서 일상생활이나 방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는 나의 잃어버린 그 몇 개의 고음 인식 능력을 슬퍼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기회에 땅을 칠 때가 있다.
바로 그 친구,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2만 원의 거액을 주고 느꼈던 ‘그 귀를 간질이는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주자들의 고음의 선율’이다. 지금은 가격이 30만 원쯤 될 로얄석에 앉아서 아무리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더라도 내 귀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 ‘귀를 간질이는 바이올린의 고음’... 나는 이를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의 선율뿐이랴? 들판을 휩쓰는 바람 속에 섞여 내 코끝을 간질이던 들풀의 향기, 엄마 젖이 이 맛일까? 생전 처음 먹어보던 양식 스프의 그 아찔한 뒷맛, 시력 2.0의 내 시력에 각기 다른 채도와 명도로 박혀오던 가을 산 단풍의 풍요로움, 대학교 때 미팅에 나가 살짝 내 손등을 스쳤던 파트너 여학생이 입었던 실크 스커트의 감촉... 일상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의 감각기관들을 타고 나를 아찔하게 감동시켰던 그 젊은 날의 경험들... 나는 오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젊은 날의 풍성하고 감미로운 자극들을 추억하며 그 친구의 젊은 날의 치기 어린 경험을 한 없이 부러워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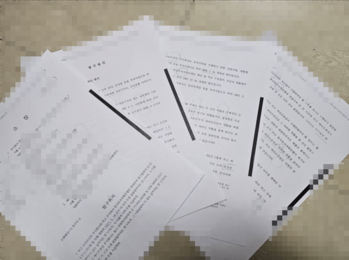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