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건너 옥상의 숭어 꾸덕꾸덕 말라가는 중이다
추석 명절 하두댁과 둑실댁이 마루에 걸터앉아
치매에 걸린 무림댁
엊그제 세상 줄 놓은 창산댁
췌장암과 투병 중인 도돌이댁
지금 옆에 없는,
생의 모래시계가 자꾸 줄어든 이들과
마음의 그늘 핑계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뚝배기에 담긴 인생이 참, 뜨겁다
하두댁은 울 장모이고, 둑실댁은 처 외숙모이다
 |
| ▲ 이은화 작가 |
[일요주간 = 이은화 작가] ( 시 감상 ) “하두댁”과 “둑실댁” 이 호칭들이 지닌 힘은 놀랍다. ‘하두’와 ‘둑실’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듯한 이름들은 오히려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모, 외숙모를 불러낸다. 불릴 때마다 고향을 기억하고 고유한 정서를 추억할 수 있는 택호. 이 이름이야말로 특정성을 극대화한 진정한 보편성이 아닐까.
시인은 “마음의 그늘 핑계 삼아” 애도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한다. 치매와 투병과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핑계가 되는 시. 슬픔조차 삶의 연대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관계는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늘에서 상실의 언어를 나눌 때 오래 지속되는 것. 거칠고 투박하지만 “뚝배기에 담긴 인생이 참, 뜨겁다”라고 말하는 시인. 그는 “참”이라는 한 음절 안에 ‘그늘’의 뜨거움과 놀라움, 수긍의 온기를 응축해 낸다.
“하두댁은 울 장모이고, 둑실댁은 처 외숙모이다.” 시 끝 행의 주석에서 시인은 완전한 내부자도 외부자도 아니다. ‘건너’라는 의미처럼 가족이면서도 타자인 관계, 그 애매한 위치에서 그는 여성들의 언어와 여성들의 연대에 이어 그녀들의 슬픔을 경청한다. 그리고 이 경외에 가까운 온기를 그는 시로 옮긴다.
이렇게 삶은 뜨겁게 끓지만 동시에 조금씩 수분을 잃어가는 것. “하두댁과 둑실댁이 마루에 걸터앉아” 나누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은 식을 새도 없이 끓는다. 삶이란 뜨거운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데우는 일. 이렇게 앉아 떠난 이와 떠나가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끝말잇기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끝을 다른 사람이 이어가는 놀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끝말을 잇고 있고 누군가는 우리의 끝말을 이을 것이다.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뜨겁게.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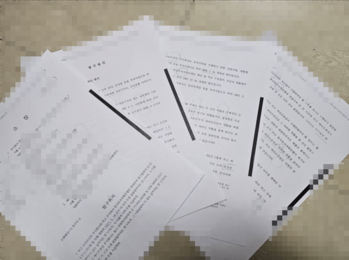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