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는 쉽사리 만나기 힘든 꽃눈을 고향에 가서 만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잠이 들깬 듯 잠긴 내 목소리가 들뜬 후배를 실망 시키지는 않았는지 전화를 끊고 나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고향 눈, 내게도 고향 눈의 추억은 많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필 겨울방학 하는 날, 종강식을 앞두고 토끼몰이를 나갔다가 능선에서 만나는 눈은 한 송이 크기가 시루떡판 같았다. 어른손바닥만한 눈송이가 ‘퍽 퍽’ 소리가 날 만큼 머리에서 부서지고 흘러내리면서 눈썹은 어느새 산타 할아버지를 담아가고 있었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친구들과 어울려 자연스레 패를 나누고 눈을 뭉쳐 던지면서 놀았다.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고 바짓가랑이가 찢어지기도 했다.
산골 초등학교는 수업을 하다가도 눈이 내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창가로 모여들면서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순식간에 운동장에는 전교생이 나와서 놀았다. 그 시절을 추억하면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어렸을 때지만 우리들은 수북하게 쌓인 눈 위에 도장을 찍듯 발자국으로 남겼던 추억들이 제법 있다. 때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에 간직했던 단발머리 여학생의 이름을 써 놓고 발개진 얼굴로 도망갔던 날도 있었고, 미운 친구의 이름 밑에 욕을 써놓고 저주했던 날도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쓰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름 옆에 사랑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쓸 줄 알았다.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고 여학생과 마주하면 가슴이 콩닥 콩닥 뛰었던 사춘기 시절에는 이 담에 커서 결혼 하자는 말도 썼던 것 같다.
수 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다. 사랑의 깊은 의미도 몰랐던 철부지시절 글장난이 눈이 내리는 풋풋한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눈은 추억을 들추기에는 좋은 소재다. 어른들은 눈의 고요가 주는 차분함에 분위기가 엄숙해진다. 지붕에 쌓인 눈이 얼기 전에 끌어내리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눈은 보리가 성장하는데 거름이라는 말이 있다. 눈을 소복하게 이불처럼 덮고 한 겨울을 보낸 보리는 누렇게 말라갔지만 봄비가 내리면 파란 싹을 피워 올렸다. 그러나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논에 나가 하루 종일 보리밟기를 했다.
아이들은 보리고랑을 따라 장난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 보면 신 안에는 흙이 가득했고 소죽솥에 데운 물을 떠내 소 죽과 비벼서 언 발을 씻었던 기억도 어제 일 같다. 그 때는 어린 마음에 눈만 내리면 보리밟기는 당장 그만둘 수 있는데 하는 원망으로 파란 하늘을 향해 손짓 발짓으로 욕을 퍼부었다.
보리밟기를 하고 온 날은 찬바람에 얼은 귀를 만지며 잠들어야 했다. 잠을 자면서도 보리고랑을 밟고 다니는 꿈을 꾸었던 그 아릿한 시절의 추억을 오늘 후배의 전화를 받으며 생각해 낸 것도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옮겨 오면서 눈과는 오래 이별해야 했다.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울산에서 눈은 귀한 존재다. 눈을 보려면 영남알프스 산군, 그 가운데서도 가지산을 등산해야 했고 산자락의 낙엽에 살포시 깔린 잔설을 보고도 감격해 한다.
전방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진절머리가 났을 눈이지만 그래도 눈은 그리움을 찾는 대상이다. 루비나가 부른 ‘눈이 내리네’라는 CD를 찾아서 들어보는 여유도 눈 오는 날의 멋스러움이다.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먼 훗날 통나무카페에서 눈을 툭툭 털고 들어서는 길손에게 따뜻한 잔에 추억을 담아 주고 싶다. 추억이라는 차를 마시면서 목이 메는 연인들을 떠 올려보면 마음이 눈처럼 포근해진다.
후배가 두 번째 전화를 했다. 고향 친구에게 탁주 세병을 사오게 해서 소죽솥 앞에 앉아 한잔하고 있단다. 눈이 내리는 날은 작은 것도 큰 추억으로 남는다. 즐거운 일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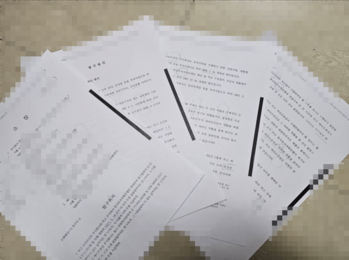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