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매일신문 조두진 기자. | ||
2,3일만 기다리면 발령지를 알게 되지만 교사들은 하루라도 일찍 발령지를 알고 싶어한다. 인사 발표 후 개학일 까지는 불과 10여일.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이삿짐도 챙기고, 인사와 악수를 나누자면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 끈을 댈만한 곳을 찾는다. 우리 신문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은 회사의 간부나 선후배들은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교육담당 기자에게 내민다. 좋은 학교로 발령 내 달라는 '거창한 청탁'이 아니고, 조금 먼저 알아봐 달라는 이른바 '작은 편의'임을 강조하면서.
쪽지를 건네받은 기자는 교육청의 공보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 교육청의 공보관은 또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전한다. 한두 건이 아니고 적어도 수십 건의 '작은 편의'가 '아쉬운 꼬리표'를 달고 교육청 인사담당자의 책상 위에 도착한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들은 펄쩍 뛴다. 담당자들은 '아쉬운 부탁'에 '미안하다'는 꼬리표를 달아 왔던 길로 돌려보낸다. 아쉬움과 미안함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가는 것이다. 이쯤으로 끝내면 무능한 기자가 된다.
이번에는 아쉬운 말 대신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협박성 멘트를 붙여 보낸다. 교육청 내의 인맥도 동원한다. 인사담당자를 궁지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유능한 기자의 반열에 올랐다. 수많은 기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방법으로 유능한 기자가 됐을 것이다. 나도 선후배들에게 크고 작은 부탁을 했고, 능력을 시험했다. 내 유능함은 기자사회의 잣대로 정직하게 평가한 결과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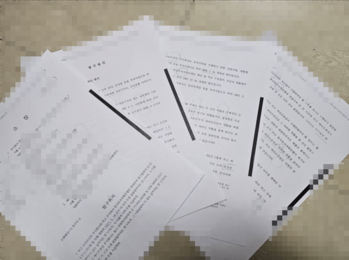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