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성호사설 등 여러 문헌 두루 기록
‘반달이 보름달로 되도록’ 풍성한 수확 기원
육남매에게 먹일 송편은 예쁜 모양이 아니라
입안을 가득채우고 배를 남산만 하게 만들어
● 고려시대 때부터 일반화 된 것으로 알려져
보름달이 동산에 불끈 솟아오르는 추석은 4대 고유명절(설 · 추석 · 한식 · 단오) 중 하나다. 추석 전날 밤 우리 육남매가 빚은 송편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큰놈, 작은 놈, 못생긴 놈 할 것 없이 채반에 가득했다. 그러나 추석날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먹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 송편이었다.
송편의 원래 이름은 소나무 ‘송(松)’과 떡 ‘병(餠)’자를 써서 ‘송병(松餠)’이라고 했다. 송병보다는 송편이 친근감이 더 간다. 아마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송편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특징이 반달모양이다. 제사상에 올렸던 송편 모양 대부분은 반달이었다. 요즘은 송편을 만들 때 주먹을 꼭 쥐어서 손가락 자국을 낸 송편도 많다.
송편에 대한 기록으로는 ‘요록(要錄)’을 시작으로 ‘성호사설(星湖僿說)’, ‘규합총서(閨閤叢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부인필지(夫人必知)’, ‘시의전서(時議全書)’가 있다. 추석에 송편을 빚는다는 기록은 주로 근대 문헌에 보인다.

조선시대 저자 미상의 식품서인 ‘요록(要錄)’에 의하면 송편은 백미가루로 떡을 만들어 솔잎과 켜켜로 쪄서 물에 씻어낸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 이익(李瀷)이 쓴 ‘성호사설(星湖僿說)’ 에서는 멥쌀과 콩으로 송편을 만든다고 했으며 1809년(순조9) ‘빙허각(憑虛閣)’ 이씨가 엮은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인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팥·꿀·계피·후추·건강말(마른 생강가루)을 이용해 송편 소를 만들어 먹는다고 했다.
1849년 조선 후기의 학자 홍석모가 발간한 우리나라 연중행사와 풍속 등을 정리하여 설명한 세시풍속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추석이 되면 햇벼로 만든 햅쌀 송편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요리서인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팥, 잣, 호도, 생강, 계피를, 19세기 말엽 조선 말기의 요리책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팥고물, 대추, 꿀, 계피, 밤 등을 소로 썼고 쑥송편은 백미에 쑥을 넣고 계피, 후추, 건강말로 맛을 낸 소를 넣어 만드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서예가 최영년의 시집 ‘해동죽지(海東竹枝)’ 에도 추석이면 햅쌀로 송편을 빚는다고 적혀 있다. 한자로는 그냥 송편이 아니라 햅쌀로 빚은 송편이라는 뜻에서 ‘신송병(新松餠)’이라고 한다.
추석은 한가위라고 해서 대보름달이 뜬다. 이것은 반달모양의 달이 점점 차올라 보름달이 된 것이다. 반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농사에도 풍성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송편은 너의 반달과 나의 반달을 만들어 맞춤으로서 온달인 보름달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송편이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 때부터 일반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시대에는 추석 때 송편을 만들어 종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송편은 아기들 돌상에도 올렸는데 송편 속처럼 머리가 꽉 차서 명석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요즘도 태어난 지 한 해가 되면 돌잔치를 차려주고 돌상에 송편을 올리기도 한다.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찌기 때문에 송편을 먹으면 소나무처럼 건강하고 끈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절개와 정조가 강해진다고 여겨왔다. 보름달이 뜨는 추석날 반달 모양의 송편을 먹는 것은 반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모든 일들이 커지고 계속 자라나라는 바람에서다.
둥근 보름달 아래서 반달 모양의 떡을 먹음으로서 계속 발전한다는 기원의 뜻이 담겨 있다. 송편은 열량이 높은 음식으로 송편 4개는 밥 2/3공기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영양가도 많고 맛도 좋다. 뿐만 아니라 송편을 직접 만드는 재미와 먹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담소가 민족명절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중추절, 가배, 한가위라고도 하는 추석에 햅쌀로 송편을 빚을 때 송편 속에 들어가는 소(송편이나 만두 따위를 만들 때 피 속에 넣어 맛을 내는 재료)는 깨고물로도 만들고, 팥고물로도 만들고, 콩이나 밤을 으깨어서도 만든다. 문헌에 따라 송편의 주재료로는 멥쌀과 기장이 쓰였으며, 소에는 콩, 팥, 후춧가루, 계피, 검은콩, 잣, 팥, 호두, 생강, 대추, 녹두, 밤, 꿀 등을 각각 또는 2~3가지씩 섞어 쓰기도 하였다.
송편은 또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도 다양했는데, 대개 북쪽 지방에서는 크게 만들고 남쪽 지방에서는 작고 예쁘게 빚었음을 알 수 있다. 송편은 가장 대표되는 한국적인 맛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 또한 솔잎을 사용한다고 해서 ‘송편(松餠)’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한 해 농사 감사! 한국만의 풍습은 아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날 밤하늘에는 휘영청 뜬 보름달을 보며 한 해 농사의 수확에 감사하는 건 우리 민족만의 풍습은 아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십오야(十五夜)’라는 명절로 즐기고 중국에서는 ‘중추절(仲秋節)’이라는 명절로 즐긴다. 이들로 달 모양의 ‘달떡’을 만들어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송편(松餠)’, 일본에서는 ‘쓰키미당고(月見團子)’, 중국에서는 ‘월병(月餠)’이라고 한다. ‘송편’은 반달모양이나 ‘쓰키미당고’나 ‘월병(月)’은 보름달 모양이다.
반달 모양의 송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선조들은 ‘동그란 보름달 모양의 떡은 야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도 완벽을 좋아하지 않는데 기인했다. 그런 이유로 완벽한 동그라미인 원(圓) 대신 반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더 신빙성 있는 설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百濟本紀 - 무령왕에서 위덕왕까지 3대 이야기)’에 있는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귀신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땅을 파보니 거북이 나왔다고 한다.
거북 등에 새겨진 글귀가 ‘백제는 만월(滿月)이고 신라는 반월(半月)이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의자왕이 무당에게 의미를 묻자 무당이 대답하기를 ‘둥근달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차차 기울어지고 반달은 점점 차오른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 말을 들은 의자왕은 대노하여 무당의 목을 베어벼렸다고 한다. 무당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다. 그 뒤로 우리 조상들은 기울어가는 보름달보다는 부풀어 가는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다는 설이다.
● 정월부터 명절을 비롯한 특별한 날에 빚어
고깃집 문 앞에서 씹는 흉내를 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먹고 싶은 것을 실제로는 먹지 못하지만 상상으로 마치 먹는 것처럼 만족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1611년에 전국 팔도의 식품과 명산지에 관하여 적은 책 '도문대작(屠門大嚼)'에 의하면 송편은 봄에 먹는 떡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849년)'을 보면 2월 초하룻날 먹는 떡이라는 기록도 있다. '머슴날' 또는 '노비일'이라고도 하는 음력 2월 초하루는 중화절(中和節)이다. 농사철이 시작되는 이날에는 머슴과 노비들에게 '농사를 잘 지으라는 뜻으로 송편을 빚어서 나이 수대로 나눠줬다. 이 송편을 '머슴송편' '노비송편' 또는 '나이떡'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송편은 추석에만 먹는 떡이 아니다.
옛 기록을 보면 송편은 특별히 추석 때 빚어 먹는 떡이 아니라 정월부터 명절을 비롯한 특별한 날에 빚던 떡이다. 조선 후기의 여항시인(閭巷詩人)인 조수삼의 시문집인 ‘추재집(秋齋集)’에는 정월 대보름날 솔잎으로 찐 송편으로 차례를 지낸다고 했다.
영조 때 문인 이의현은 정월에는 떡국, 대보름에는 약식, 삼짇날에는 송편을 먹는다고 했다. 인조 때 이식이 쓴 '택당집(澤堂集)'에는 초파일에 송편을 준비한다고 나와 있다. 조선시대 관례 · 혼례 · 상례 · 제례에 관한 이재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단오 그리고 유두절에도 송편을 빚는다고 기록돼 있다.
추석에 먹는 송편은 정확하게는 ‘오려 송편’이라고 한다. '오려'는 올벼의 옛말로 제철보다 일찍 익는 벼를 말한다. 올해 농사지어 수확한 햅쌀로 빚은 송편이라는 뜻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송편은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즐겨 빚어 먹던 우리 민족의 대표 떡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다만 현대에 들어 다른 명절은 의미가 퇴색되고 설날과 추석만 명절로 인정되고 있어 송편을 추석 때 먹는 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 종류도 다양,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송편은 만드는 재료도 다양해서 굳이 햅쌀이 아니더라도 조, 수수, 옥수수, 감자, 도토리 등도 가루로 만들어 빚었다. 햅쌀로 만드는 오려 송편, 쌀 앙금인 무리를 반죽하여 빚은 무리 송편, 보리쌀로 빚는 보리 송편 등 송편 종류도 다양하다.
송편에 들어가는 소도 지역별로 모양과 내용물이 다르다. 함경도 ‘언 감자송편’은 강원도와 인접하여 강원도처럼 투박하게 쥐어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온도가 낮고 산간 지역이 많은 함경도에서는 겨울이 되면 밭에 있는 감자들이 얼었다. 봄이 와서 녹은 감자로 만든 것이 언 감자송편이다. 이것은 곱게 빻은 언 감자가루를 반죽해 소금으로 간한 팥 소를 넣고 쪄서 만든다.
평안도 송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금이 아닌 설탕과 간장으로 간을 한다. 해안과 인접한 평안도에서는 조개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많이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다. 평안도 지방의 조개송편은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깨 소를 넣어 만든다. 일반 송편과 비슷하게 만들지만 설탕과 간장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더 강하다.
황해도의 ‘큰 송편’은 여자 손바닥만 한 크기다. 큰 송편은 팥 소를 듬뿍 채워서 만든다. 큰 송편이란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반달 모양으로 커다랗게 만든 송편을 네 손가락으로 꼬옥 눌러 손자국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황해도 송편은 일반 송편보다 5배 이상 커 크기로 압도한다.
강원도 ‘감자 송편’은 감자녹말을 익반죽하여 팥 소나 풋 강낭콩 소를 넣고 송편으로 빚어 찐 떡으로 뜨거울 때 먹으면 쫄깃한 맛이 별미다. 그 외에도 ‘무 송편’과 ‘도토리 송편’이 있다.
무 송편은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무를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꽉 짜서 물기를 없앤 다음 고춧가루 등으로 갖은 양념을 한 것을 넣고 보통 송편 보다 약간 크게 빚어 찐 것이다. 이 송편은 얼큰한 맛이 특징이어서 술꾼 들이 즐겨 먹는다. 도토리 송편은 멥쌀가루에 도토리 가루를 섞어 익반죽한 뒤, 팥 소를 넣고 찐 송편이다.
서울 송편은 작고 귀여워 한입에 쏙 들어가 서울깍쟁이 같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특히 오색송편은 알록달록 빛깔이 화려해서 음식에 멋을 중요시하는 서울 지역의 특색이 담겨있다. 오미자, 치자, 송기, 쑥 등의 천연 재료로 색을 낸다.
충청도 ‘호박 송편’은 늙은 호박을 썰어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어 멥쌀가루에 섞어 익반죽한 다음, 소를 넣고 송편을 빚어서 솔잎을 얹어 찐 것이다. 맛이 좋을 뿐 아니라 호박의 노란 색이 선명하여 볼품이 있다.
경상도 ‘꿀떡 송편’은 멥쌀가루에 물감을 들여 익반죽한 다음 소를 넣고 꽃처럼 빚어 찐 화려한 모양이다. 특히 거창 송편은 일반적인 송편을 만들어 찔 때에는 솔잎 대신 망개잎을 깔고 찐다.
전라도 ‘꽃 송편’은 송편 위에 오색의 떡 반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부친 떡이다. 전라도는 음식이 풍성하게 발달한 지역답게 송편도 화려하다. 쑥, 치자, 송기, 포도즙, 오미자즙 따위를 넣고 만들어 그야말로 무지갯빛이다.
꽃 모양으로 빚는 꽃 송편은 ‘매화 송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시 이파리를 넣은 모싯잎 송편은 전남 고흥 · 영광 등에서 주로 먹어온 송편으로 요즘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 모시 잎에 철분이 많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는 소문났기 때문이다.
모시 송편은 멥쌀가루에 삶은 모시 잎을 섞어 반죽한 다음 송편을 빚어 찐 뒤 감잎에 싸서 내놓는다. 특히 ‘삐삐떡’이라고 부르는 삘기 송편은 멥쌀가루에 삘기를 섞어 만든 전라도 지방 특유의 송편이다.
제주도 송편은 육지 사람들에게는 낯선 비행접시 모양이 특색이다. 동글동글하며 납작한 것이 귀엽다. 소는 완두콩을 넣는다. 완두콩 송편은 동그란 송편을 반으로 가르면 연두색 완두소가 나온다.
깔끔하고 달큰한 맛이 나는 송편이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북쪽 지방은 크게 남쪽 지방은 작고 예쁘게 빚는 특징이 있다.
송편을 찔 때 솔잎을 쓰는 까닭은 송편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솔잎에는 소나무 특유의 성분인 피톤치드가 들어 있어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이 피톤치드가 떡을 상하지 않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신선한 솔잎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살충제 등이 묻었을까 걱정이 돼 솔잎을 사용하지 않고 찌기도 한다.
송편을 맛있게 만들려면 먼저 멥쌀을 물에 담갔다가 빻아 고운 체에 내린다. 이때 물을 끓여서 소금을 넣어 쌀가루에 고루 뿌린다. 다음에 오래 치대어 말랑하게 만들어 젖은 물수건을 덮어 놓는다. 쌀가루를 빻을 때 너무 곱게 빻으면 송편이 되게 되고, 굵게 빻으면 송편을 먹을 때 식감이 거칠다.
반죽도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송편 모양을 예쁘게 빚을 수 있다. 송편을 찔 때는 물이 완전히 끓어 김이 충분히 올라올 때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떡이 풀어지거나 질어져 송편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 없다. 송편을 만들 때는 엄지손가락을 넣어 돌려 우물처럼 만들어 소를 채워서 위아래를 입술처럼 아물린다. 다음에는 시루에 빚은 송편과 솔잎을 켜켜로 놓아 쪄 낸다. 후에 찬물에 담가 솔잎을 떼고 참기름을 바르면 먹음직한 송편이 된다.
● 송편은 가족의 정이 듬뿍 든 음식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송편을 빚어 먹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예쁘게 송편을 빚는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임신한 여자가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하면 송편 속에 솔잎을 가로로 넣고 찐 다음 한쪽을 깨물었을 때 솔잎이 소나무에 붙은 쪽을 깨물면 딸을 낳고 솔잎 뾰족한 쪽을 깨물면 아들을 낳는다고 점을 치기도 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얻는다고 송편 빚기에 정성을 다 하였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만들어 먹는 송편은 가족의 정이 듬뿍 든 음식이었다.
요즘은 집에서 송편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화로 핵가족화가 되어 가족의 수도 줄어들어 많은 송편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떡 방앗간에서 기다려면서 송편을 만들어 먹는 집도 없다. 대부분의 가정이 떡집이나 슈퍼마켓에서 송편 한 두 팩 사 먹는 정도다. 이제는 송편을 빚는 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인 송편이 추억속의 음식이 되었다. 향기로운 솔잎만큼이나 훈훈했던 송편을 빚어 먹던 옛날이 그립다는 노인들이 많다.
올 추석에도 아내가 만든 송편을 먹는다. 오밀조밀하게 만든 송편, 한입에 쏙 들어가는 송편, 알록달록한 송편을 설탕에 꼭꼭 찍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어린 날 송편을 주먹만 하게 빚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던 일을 생각하면 목이 멘다.
추석 전날 밤, 어머니의 송편을 보고 저게 무슨 송편이냐고 불만스럽게 바라봤던 나는, 자식 육남매에게 먹일 어머니의 송편은 예쁜 모양이 아니라 자식들의 입안을 가득 채우고 배를 남산만 하게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것이라는 것을 그 때는 몰랐다.
주먹만 한 송편은 창피한 것이고 그런 송편을 빚는 어머니는 부끄러운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송편을 먹으면서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안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육남매를 위해서 송편을 빚을 것이라는 우매한 생각 때문이었다. 송편 같지도 않은 송편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던 불쌍한 자식은, 올 추석에도 어머니의 못 생긴 송편을 그리워한다.
< 프로필 >
•저서 : 시집 공든 탑 외. 동시집 첫꽃 외. 동화 폐암걸린호랑이 외
•수상 : 세종문화상. 소월시문학대상. 아르코문학창작기금수혜
•현) 울산광역매일, 한국영농신문, 내외매일뉴스, 전주일보 연재 중
•현) 향촌문학회장, 미래다문화발전협의회장. 문인과 문학회장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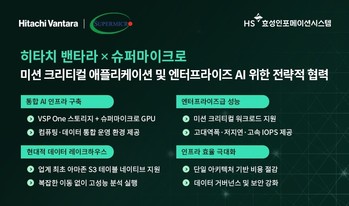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