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제9화_대화 속 바디랭귀지, 선택이 아닌 ‘필수’
바디랭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1971년 출간된 저서 <Silent Messages>에서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된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데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그 영향이 미비한 반면 말 할 때의 태도, 목소리나 어조는 38%, 표정이나 몸짓은 55%를 차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한다. 하지만 메라비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다. 근래에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오히려 바디랭귀지(Bodylanguage, 몸짓언어)에서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 확증 편향(지각의 오류)을 일으키기 쉽다고 말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 엘리자베스 뉴턴(Elizsbeth Newton)은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간단한 놀이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두드리는 사람은 생일축하노래나 미국의 국가 같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만한 노래의 목록을 받았다. 그들이 목록에 적힌 노래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노래의 리듬에 맞춰 책상을 두드리면 다른 사람이 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를 맞추는 실험이었다.
노래의 목록은 총 25곡, 선택된 노래는 총 120곡이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중 2.5%에 불과한 3개의 노래밖에 맞추지 못했다.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책상을 두드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정답을 맞힐 것이라고 생각한 정답 예측수치가 무려 60곡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심리학 용어로 ‘지식의 저주(The Curse of Knowledge)’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노래를 선택한 사람은 책상을 두드릴 때 머릿속에서 익숙한 선율이 들린다. 반면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들릴 리가 없다. 단순히 딱딱 거리는 소리만을 듣게 되는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 리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3곡이나 맞춘 것도 신통하다.
사람은 일단 무언가를 알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지식이 관념으로 고정되게 되면 그러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를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한다. 사람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기억할 때 그것이 모호한 증거라 할지라도 기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몸짓언어에서 팔짱을 끼는 행위는 ‘방어자세’나 ‘셀프터치’의 개념이다.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조심해야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셀프터치’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을 만지며 위로하는 행위이다. 참고로 바디랭귀지는 특히 이성과의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그 진가가 확실하게 발휘된다. 앞으로의 예는 이성과의 대화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통상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녀가 팔짱을 끼고 있다면 나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지 않았거나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몸짓언어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상대방의 팔짱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때로 확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얘기를 들을 때나 집중 할 때 팔짱을 끼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녀는 팔에 근육통을 느껴서 팔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등이 뻐근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순히 그녀가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더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녀의 신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는 그녀의 관심을 호감으로 바꿀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몸짓언어에 주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싶다면 지각의 오류를 주의하자. 이러한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데는 상대방의 몸짓의 증거를 되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관심의 표시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팔짱을 끼고는 있지만 그녀의 발끝이 나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의 전체적인 방향은 나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나와 3초 이상 눈이 마주치는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자. 몸짓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표정이나 말투와 같은 다른 관심의 지표를 살펴 정보를 모아서 통합하자.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연재중인 기사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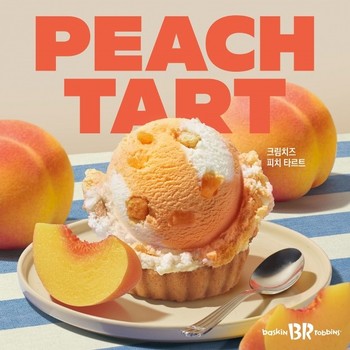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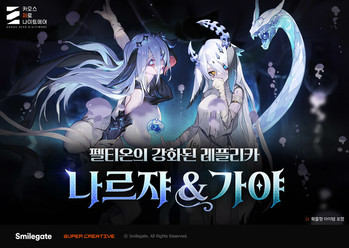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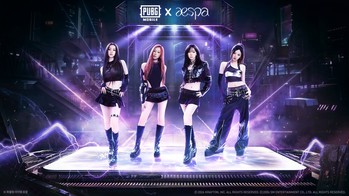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