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금종 발행인 |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두 달이 되어 간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시설에 포격을 가하며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 평온한 삶을 이어가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황폐한 도시로 변했다.
올해 3월 30일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날인 2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총 401만9,2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쪽으로 국경을 맞댄 유럽 이웃 국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6월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 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동기관의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시리아(490만명), 아프가니스탄(270만명), 소말리아(110만명), 이 3개국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있는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였다.
유엔은(UN)은 ‘인종과 종교, 민족과 신분,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유엔은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가 아프리카통일기구와 논의하여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첫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았던 2001년은 난민협약 채택(1951년 7월 28일)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권, 통역 지원, 이의 신청 제도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한층 주력해야 한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한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 보장, 교육 보장, 사회 적응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폭력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를 피해 도망친 난민을 동일시하면서 난민을 범죄 집단으로 몰거나, 난민을 돕자는 이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이처럼, 문화나 종교가 다른 이들을 난민으로 받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종교를 가진 난민들만 선별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이들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와 충격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난민관련 조사관 워크숍, 세계 난민의 날 행사, 난민보호의제 한국어판 출간, 난민인권실태조사, 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토론회, 난민 대상 순회인권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이질적인 우리나라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1919년 4월 11일,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뒤, 조국을 떠나온 대한제국의 망명객들이 정부를 세웠다.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난민’이었고, 그들이 세운 망명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다.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성별에 관계없이 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다. 현재 세계 난민들이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총력적 전폭 협력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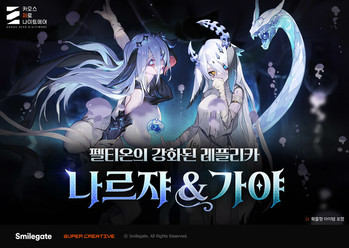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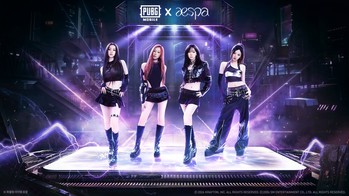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