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쌍주 대기자 |
이런 속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생물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번데기가 어떻게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지 알고 싶었다. 한번은 그 아이가 풀숲에서 번데기 하나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와 매일매일 관찰을 하였다.
며칠 후 번데기에는 틈이 생기면서 안쪽에는 나비가 꿈틀거리며 고치를 벗고 날아오를 기미를 보였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고난의 시기에 나비는 고치에서 힘겹게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칼로 번데기를 열고 나비를 나오게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와도 날개에 힘이 부족해서 전혀 날 수 없었다. 오래지 않아 나비는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은 원래 고통스럽고 힘겹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야만 비로소 날아올라 훨훨 날개 짓을 할 수 있다. 외부의 도움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위반하면 결국 나비는 비참하게 죽고 만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인생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우리속담에도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는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다. 즉,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아무리 급해도 순서에 따라서 도리를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일에는 양적변화가 있으면 질적 변화도 있기에 절대로 초조해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순간의 속도만을 생각하여 이 같은 도리에 역행한다면, 결과는 오히려 목표했던 바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모든 일을 빠르게 완성하고 싶다면, 빠름의 효과는 결코 좋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 급하게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급하게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결국 실패를 불러 올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야 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자연히 도랑이 생기듯,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은 자연스럽게 성사된다.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고난의 몸부림과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 시기를 겪고 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중국 속담인 “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두부를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곧, 마음이 급하면 아무 일도 못 해낸다는 의미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야지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뜻이다.
요즘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의 대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담을 쌓을 때도 돌을 대충 쌓으면 빨리 완성할 수 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한다. 돌 하나라도 틈새 없이 차곡차곡 잘 쌓아야 수 천 년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돌담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면 날림 공사를 피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시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빠름과 느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절대적이지 않다. 1년 365일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이고, 하루 24시간은 남극과 북극을 축으로 한 번 도는 자전주기다. 시간은 공전과 자전주기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다.
태양계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하루를 의미하는 시간의 양은 늘어난다. 해왕성의 공전기간은 6만 일에 달한다. 이는 164년이 넘는 시간으로 해왕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에 비해 엄청나게 길다. 그리고 지구에서 하루를 의미하는 24시간은 달과의 인력 때문에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하루는 매년 10만 분의 7초씩 늘어나고 있는데, 공룡이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쥐라기의 하루는 지금보다 15분 정도 짧았다. 미래의 하루는 지금의 24시간보다 많이 길어질 것이다. 하루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환호할 일이다. 길어지고 때로는 짧아지는 시간은 미래로만 향한다. 시간의 화살은 과거로 방향을 틀지 못한다.
빅뱅으로부터 139억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별들의 생명이 다하는 데는 다시 억겁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그 찰나의 짧은 호흡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어떤 작가는 파도가 칠 때 튀는 작은 물방울이 생겼다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도 했다.
몇 백조 년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는 전체우주의 장대한 생명 속에서 우리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짧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 순간에도 인간이라는 작은 우주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만약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우리가 남긴 짧은 흔적을 분명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시속 1,667km의 속도로 돌고 있다. 남극점과 북극점의 속도는 0에 가깝다.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은 1,337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태양계를 방문한 외계인이 돌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저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다.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휘둘릴 때도 많지만, 대개 찻잔 속의 폭풍처럼 금세 수그러진다. 마하의 속도를 가진 점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시속 800km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달이 지구로부터 매년 4cm씩 멀어지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영원하지 않지만 셀 수 없을 만큼 긴 우주의 시간 속에 셀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럴수록 더 천천히 살아볼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스스로 채찍을 들어 재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람에게는 주어진 호흡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그 횟수를 다하면 생을 마감한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호흡해야, 그만큼 더 오래 살 수 있다. 빠름을 이기는 느림의 가치를 인식해야 할 때이다. 우리인생살이에는 정답은 없다. 하루가 정확히 24시간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하루의 길이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인생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빠르고 느린 생장이 서로 어울린 흔적이다. 계절에 따라 세포분열의 속도가 달라 나이테가 생긴다. 영양이 풍부한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겨울이 오면 성장이 더뎌져 둥근 모양의 나이테를 갖게 된다. 빠름과 느림은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야구에서 속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느린 커브를 함께 던져야 하듯이, 세상은 여전히 빨리 돌아가고 있지만, 장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하다.
인생이든 야구든 빨리 빨리 와 천천히가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느리게 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이야기의 유머가 있다. 토끼는 자고, 거북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달팽이가 낑낑대고 가고 있었다. 거북이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야! 타” 하며, 자신의 등에 태웠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굼뱅이가 낑낑대고 가고 있었다. 거북이가 굼뱅이에게 “야! 타”하며 태워주었다. 먼저타고 있던 달팽이가 굼뱅이를 보더니“꽉 잡아 엄청 빨라”라고 말했다. 비록 유머이긴 하지만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지 않은가. 마음에 욕심이 차오를 때는 오히려 가난했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떠한가. 인내는 큰 문제없이 오래갈 수 있게 하는 근원이다. 분노는 적이다.
네 자신을 탓할 뿐 결코 남을 탓하지 말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기 보다는 모자란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풀잎위의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빠름을 이기는 느림의 가치를 인식해야 할 때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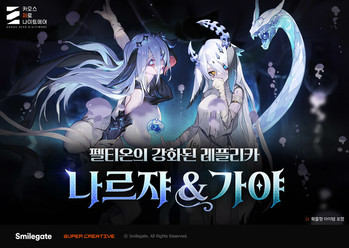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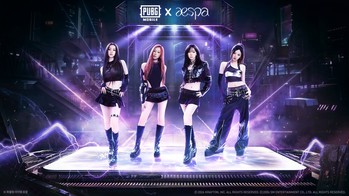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