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그림
이병률
미술관의 두 사람은 각자
이 방과 저 방을 저 방과 이 방을 지키는 일을 했다
사람들에게 그림을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졌다
자신들은 서로를 깊게 바라보다
만지고 쓰다듬는 일로 바로 넘어갔다
두 사람은 각자 담당하는 공간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나란히 공간을 옮겨 다녔다
그림이 그 두 사람을 졸졸 따라다녔다
두 사람을 그림 안으로 넣겠다고
그림이 두 사람을 따라다녔다
 |
| ▲ 이은화 작가 |
이 시의 두 사람의 인연은 미술관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 작품과 관람객 사이 감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일.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이 오히려 행위 예술을 관람하는 것처럼 읽힌다. 마치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 속 전시된 인물과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처럼 말이다. ‘사람들에게 그림을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졌다/ 자신들은 서로를 깊게 바라보다/ 만지고 쓰다듬는 일로 바로 넘어갔다’ 미술관의 작품들이 멋있다고 한들, 사람 마음을 감상하는 재미보다 더하겠는가. 겹꽃처럼 마음 겹치는 사연을 영상처럼 들려주는 시, 어느 날 마주친 눈빛과 스치는 웃음과 귓전에 잠시 머문 목소리처럼 찾아오는. 그러나 우리 삶 안에 각인된 무늬로 남거나 어떤 만남은 눈송이처럼 녹는 인연도 있다.
관람객과 작품들 사이에서 인연을 맺는 두 사람, 우연과 필연을 건너뛴 인연이라니. ‘두 사람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나란히 공간을 옮겨 다녔다’ 이 부분에서 한 편의 그림이 완성되는 시. 누구라도 액자에 담으면 작품이 되는 사연 하나쯤 있을 듯한 여름밤, 지금 「어떤 그림」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는 인연일까요.”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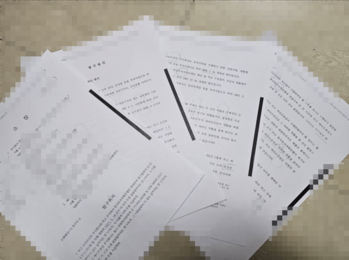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