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
| ▲ 오늘 시인 |
[일요주간 = 이은화 작가] ▼오늘 시인은 2006년「서시」로 등단했다. 2015년 한국문예진흥기금 수혜를 받았으며 2020년 제10회 시산맥작품상과 2021년 제16회 지리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첫 시집 「나비야, 나야」(2017년 세종우수도서)가 있고 이어 두 번째 시집 「빨강해」를 출간했다. 저서로는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 연구」가 있다.
●선생님의 일상에서 특별히 마음에 담고 있는 문장이나 어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문장과 어휘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말은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림짐작으로 해야만 하는 적당의 규범은 힘들고 모질게 느껴집니다. 저의 적당과 상대가 가진 적당의 기준점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용기를 낸 말은 ‘모른다’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장녀로서, 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는 척 괜찮은 척은 꽤 한 듯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르는 것에 대한 과한 부끄럼이 없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빨강해」는 시각적 색채가 강렬한 제목입니다. 시편들에 담긴 상징과 비유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해, 고마워해, 혼자 있고 싶어 해, 그리워해, 같이 밥 먹고 싶어 해, 너를 기억해, 안아주었으면 해, 무서워해, 후회해 기타 등등… 이 모든 말을 통칭하는 것으로 택한 것이 ‘빨강해’였습니다. 작품 속을 보면 말하는 주체나 듣는 주체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들여다보면 나랑 똑 닮아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결국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룬다는 생각입니다.
서운하게 했던 대상이 꼭 안아주며 서운한 게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할 때, 조심스레 한두 가지 얘기하다가 설움이 터져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까지 쏟은 것 같은 상징과 비유들이 많습니다. 글을 쓰고나서 보면 어? 이런 마음을 내가 썼다고? 할 때가 많아 종종 놀랄 때가 있어요. 제게 ‘원고’란 속마음을 다 말하라며 품을 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나비야, 나야」, 「빨강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두 작품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시집인 「나비야, 나야」는 등단 10여 년 만에 낸 시집입니다. 제 글들이 엮어서 보일 만큼인지, 부끄럽고 미안해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대체로 첫 시집은 가족사나 개인의 성장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의 힘들고 애틋한 순간들을 배제하고 주변과 사물, 그리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작품들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 시집인 「빨강해」는 주로 개인적인 우울과 사회적인 우울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치열한 감정들이 도처의 나를 이루고 관망합니다. 우울은 어둡고 습한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몸을 덮을 수 있는 쉼이며 작품을 만드는 모든 이의 근간입니다. ‘빨강하다’며 사유를 전하고, 사는 게 ‘빨강한지’ 묻는 말들이 빼곡한 시집입니다. 부디 빨강하기를 바라면서요.(웃음)
●책 만드는 일과 시를 쓰는 일을 겸하고 계시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 번째 책은 ‘이런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과 계획이 있을까요.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 제가 제일 먼저 누군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제게 책을 만드는 일은 선물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포장지를 고르고, 장식을 달며,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만든다는 건 귀한 것을 담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작품을 검색하다가 어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받은 돈으로 큰마음 먹고 샀다며 제 시집을 포스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가치 있게 썼다며 뿌듯해하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한 푼의 마음이라도 더 담아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시의 초안이 됩니다. 지나가는 순간을 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일까 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집은 한 푼을 지키는 힘들이 더 크고 세지지 않을까 합니다.
●독자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어떤 시일까요.
우리
안의 상처는 바깥의 상처로 잠시 잊을 수 있다 안의 상처가 거세지면 바깥의 상처는 감각을 부수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
모든 바깥은 안이 된다
안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바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뒤집힌 안은 바깥이 되고
나는 한 번도 너의 바깥인 적 없다
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4월은 먼지와 꽃을 앓으면서 봄의 뼈대를 물고 있다 행복한 개는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들고 슬픈 개는 왼쪽으로 흔든다는데 나의 고개는 안쪽으로 기울고 또 나는 바깥쪽으로만 기운다 불투명한 시대에 살면서 방향 때문에 외롭지는 말자
우리가 우거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우스운 모습이 앙상할 때만
뚜렷하게 보이는 우리
안과 밖의 어디쯤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라는 말
▼어떤 무엇 때문에 형성된 ‘우리’가 아닌 서로에게 힘과 쉴 곳이 되는 ‘우리’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평소 문학에 대한 작가님의 신념이나 세계관이 듣고 싶습니다.
▼의지를 벗어난 무게에 삶이 눌릴 때 시인들은 가장 먼저 시대를 향한 직설자가 됩니다. 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인지 근래 발표되고 있는 작품마다 블루의 모호한 기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 대부분은 텍스트만으로 온전히 장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변의 불신입니다. 언젠가부터 바이러스로 인해 손의 접촉이 꺼림직해졌습니다. 손은 희생의 표상이며 건넬 수 있는 최초의 위로였기에 유감이 무척 깊습니다. 악수조차도 선뜻할 수 없는 지독한 이기의 날들 속에서 문학은 시대의 내밀한 표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언제나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두기를 주도하지만 외면의 상황이 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불안정한 시국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택해야 독자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에서. 불안에서. 문학이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는 공감입니다.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수많은 결핍의 바이러스를 견디고 있는 현시대의 독자들에게 문학이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독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인이기에 시로써 모든 말을 건넵니다. 제 작품들은 망각하고 싶은 고통의 기록이었거나 끝내 잊히기를 거부하는 트라우마일 테지만,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치유될 수 없는 외상성 징후일지라도 말입니다. 읽다 보면 제가 피워내려는 나비를 발견하는 독자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 나비를 찾아 독자님의 마음을 겹쳐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체온으로 나비가 활짝 피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도하지 않아도 쉽지 않게 흐르듯 제 작품들도 그러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협곡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님들의 창에 많은 빛이 깃들길 바라며, 우연처럼 어느 행간에서 마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 이은화 작가 |
[일요주간 = 이은화 작가]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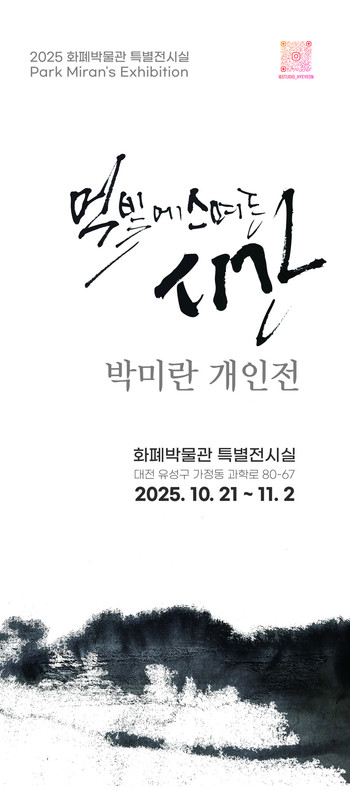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