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배남효 고전연구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공수신퇴는 공을 이루면 몸이 물러난다는 뜻이고, 장경오훼는 목이 길고 입이 검게 튀어 나왔다는 뜻이다.
좀더 보충 설명하면 공수신퇴는 공을 이룬 곳에서 오래 머물다가는 화를 입고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빨리 물러나서 보신(保身)을 잘 해야 함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다.
장경오훼는 목이 길고 까마귀처럼 입이 검게 튀어 나온 사람은 어려움을 같이 하며 도모할 수는 있으나, 성공 후에 시기심이 많아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사기(史記)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를 보면 이 말과 관련된 인물인 월왕 구천과 신하 범려와 문종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정치적 스토리는 대단히 흥미롭다.
춘추시대(BC770-403년)는 주나라가 쇠퇴하고 제후국들이 천하를 제패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였는데, 제 진 초 오 월의 다섯 제후국이 순서대로 천하를 제패하여 역사적으로는 춘추오패(春秋五覇)라 부른다.
이 춘추오패의 다섯 번째 마지막 패자가 월왕 구천이고, 범려와 문종은 그 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명신(名臣)들이다.
월왕 구천은 패자가 되기까지 정치 라이벌인 오나라 왕 부차와 숙명적인 승패를 다투는 오월항쟁(吳越抗爭)을 길게 치루어야만 했다.
오월항쟁의 역사는 유명한 고사성어인 와신상담을 만들어낼 만큼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교훈을 많이 남겨주었다.
먼저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목숨을 구걸하여 인질로 잡혀가 연명하면서 역경 속에 와신상담의 복수극를 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려와 문종은 구천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면서 심모원려한 지략들을 구사하여, 결국은 구천이 부차에게 승리하도록 만든 주역들이었다.
월왕 구천이 오월항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자, 범려는 공수신퇴의 이치에 따라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야반도주하는 철저한 명철보신(明哲保身)의 길을 택했다.
그러면서 구천을 도우면서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절친한 동료 문종에게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이치가 담긴 편지를 남겼다.
‘하늘의 새가 다하면 양궁도 창고에 넣어 두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겨 죽게 되오. 월왕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은 까마귀처럼 검게 튀어나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누릴 수는 없소. 그대는 어째서 떠나지 않는 것이오? (蜚鳥? 良弓?, 狡?死 走狗烹. 越王?人長?鳥喙, 可與共患難, 不可與共樂. 子何不去)’
그러나 문종은 범려의 충고에도 바로 떠날 결심을 못 하는데, 구천이 문종의 재주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여 숙청을 지시하게 되었다.
구천은 문종에게 ‘그대가 과인에게 오나라를 치는 일곱 가지 술책을 가르쳐 주어 과인이 그중에 셋을 써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머지 네 가지가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 선왕(先王)을 따라 시험해 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문종은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자살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500여년 이전에 일어났던 아주 옛날의 정치극이어서, 어쩌면 현대에 벌어지는 정치극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권력을 다투며 벌이게 되는 정치 투쟁은 그 본질의 측면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왜냐 하면 누구나 오로지 많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쟁취하려 투쟁하는 과정에서는 협력과 동업을 하다가도,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독점을 하려고 나서는 것이 인간의 권력욕인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는 정치는 생물이라서 똥누러 갈 때 다르고, 똥누고 나올 때 다르다는 자조섞인 유행어까지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욕을 채우려는 정치 투쟁은 골육상쟁도 피하지 않을 만큼 지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알고 명철하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기에 나오는 오월항쟁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장경오훼라는 말로 구천의 관상까지 거론하고 있어 더욱 재미가 있다.
이 장경오훼의 상이 왜 어려움은 같이 하지만 즐거움은 같이 누릴 수 없는지, 관상학적인 설명이 궁금하기도 한데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원래 입술이 검게 두터운 사람이 욕심이 많고, 또 목이 길고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 이익을 밝힌다는 사실은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다.
아마 그래서 목이 길고 입이 검게 튀어나온 사람이 욕심이 많고 이익을 밝히기만 잘 하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인색하니 그런 관상법이 나왔을 것이다.
우리 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도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최고 지도자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토사구팽당한 측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아마 밀려난 측근들이 구천의 고사나 장경오훼의 관상에 대해 미리 잘 알았더라면, 적당히 처신하면서 이익을 잘 챙겼을 것인데 몰랐던 모양이다.
또 공수신퇴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고전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유명한 말이기도 하다.
공을 세우면 물러난다는 말뜻 자체는 쉬운데 실제로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많은 뛰어난 인물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 화를 입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문종이란 인물은 매우 지략이 뛰어나 온갖 계책으로 구천을 도우며 실력을 발휘했지만, 공수신퇴의 도를 깨우치지 못해 목숨을 잃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문종은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면서까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만큼 공수신퇴를 직접 실천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도 공수신퇴를 못해 패가망신하는 사례는 줄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권력의 생리를 냉철히 꿰뚫어보고 자신을 살피는 깊은 성찰이 없이는 깨우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공수신퇴의 도(道)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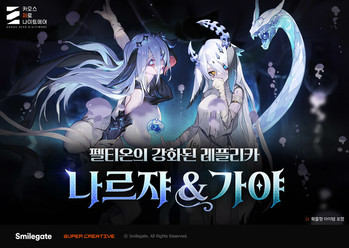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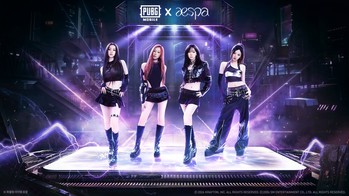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