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최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16억 6천만 원이 들어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넘어 법원예산을 전용한 추가 투입분 6억 6천만 원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장은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법전용이라는 추궁이 이어졌고 대법원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다. 예산의 이용 전용에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의원들은 법원 내부에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는 게 문제라며, 개방직으로 외부 회계전문가를 뽑아 대법원의 예산사용과 관리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관이란 정부의 고위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한다. 공관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수장 등이 재임기간에 사용하는 저택을 공관(空館)또는 관사라고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급 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사용하는 공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고, 이들 공관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또한 엄청나다. 그동안 관사는 자치단체의 수장이 머무는 공간으로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조선조에는 목사나 현령이 파견된 지방도시에 관아가 자리했고, 이곳을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졌다. 이런 전통은 일제패망 이후 수립된 정부 때도 이어졌다.
공관(관사)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VIP접대를 위한 연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지방 각급 기관장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특히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면서 은밀한 인사 청탁이나 로비 장소로도 이용됐다.
그러나 요즘 상당수 공관(관사)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바뀌거나 아예 폐쇄를 하고 있다. 지금껏 남은 관사는 기관장의 개인 집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교류 장소로서의 기능은 잃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지금껏 관사를 꿋꿋하게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지방자치제가 일찍 뿌리내린 유럽과 미국·일본 등은 선거로 뽑힌 기관장에게 공관이나 관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본인의 집에서 거주한다. 외부 손님을 맞을 때는 집무실이나 호텔 등을 이용한다. 기관장의 관사는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며, 공무는 대부분 영빈관이나 주변의 호텔을 이용한다.
사실 이러한 지금의 공관(관사) 모습은 일제시대의 산물이다. 요즘 시대에 자기 집이 없는 기관장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굳이 국민혈세로 공관까지 마련해 줄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공관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서 공공기관의 공관제도의 전면폐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특정인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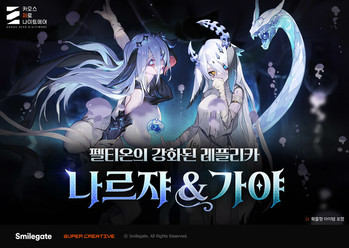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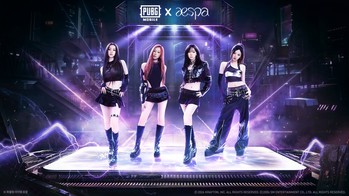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