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철원 논설위원 |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죽은 이만 서럽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죽은 이의 죽음에 부여된 가치가 훼손되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사회가 죽은 이만 서러운 사회라면 누가 이 사회를 위해 자기희생을 할 것이며,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제 죽은 이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번영과 안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죽은 이만 서럽게 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에 대해서도, 6.25 전쟁 전사자에 대해서도, 저 어두운 1980년 시대 총 칼 앞에 맨손으로 싸운 민주열사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근년에 정치적 정파적 이해득실의 잣대가 판단기준이 되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 전사자에 대해서도 그렇다. 만일 그들의 죽음에 정치성 논리가 자리 잡아 숭고성이 사라진다면 그 죽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조국을 위해 죽은 죽음에 대한 가치를 세워 형성하고 다듬어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이일은 개인이든 국가든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엄중한 책무다. 미국이 북한 땅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를 미군 실종자에 대해 마지막 한 명의 유해라도 끝까지 찾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조국을 위해 적지에서 죽어간 죽음에 대해 조국이 그 가치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깝다.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조차 귀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유해 송환 문제는 꺼낼 수 조차 없다. 전장(戰場)에서 산화한 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 영웅들, 7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들의 죽음의 가치는 누가 형성해 줄 것인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 죽음을 평생 기억한다. 그날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며 고인의 삶을 추억한다. 억울한 죽음일 경우는 더욱 뼈저리게 아파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에게도 내 가족의 죽음을 대하듯 우리들 마음만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인 지난달 30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는 옹호해 줄 투사들이 필요하다. 군인과 가족들이 겪을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링컨 대통령도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용사들이 이곳에서 이뤄낸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사명에 헌신하자"며 남은 이들의 의무를 강조하며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가치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산하는 세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죽음을 정치적 논리로 숭고한 죽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가족이 국가를 위해 죽었다면 과연 그러하겠는가. 국가를 위한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나의 죽음의 가치를 부여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죽음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삶의 가치는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죽음의 가치는 내가 만들 수 없지 않은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죽음을 살아 있는 자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죽음이라도 빛이 바래고 만다.
독립유가족의 예우와 보상이 국가 경제발전에 비유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예우와 보상은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다. 그 시절 화폐 가치와 지금 화폐 가치의 비유가 같은가. 오죽하면 우리 사회에 '독립유가족은 3대가 가난에 헤여나지 못하고 밥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겠는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직한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도 미흡하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최근년에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죽음과 전사자의 보상이 형평성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이는 전자(前者)의 죽음은 경제발전 규모에 걸맞게 적용을 받아 혜택을 누렸지만 후자(後者)의 죽음은 경제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후진국형이다. 심지어 전자는 정치권자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상이 부족하면 온갖 구실을 붙여 특별법까지 만들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래서 힘없이 죽는 이만 서러운 것이다.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젊은 영혼들은 조국의 부름에 순응해 국가를 위해 자기희생적 참여로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의 선도성을 보며 오늘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그들의 값진 희생을 가치 있게 세워주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게 주변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를 위해 죽은 이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죽음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더욱 겸허해져야 한다. 조국에 목숨을 바친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 않은가.
이 시대 국가는 개인은 그들의 숭고한 죽음과 남은 유족을 위해 어떤 것을 했는가? 과연 이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올바름이고 정의인가? 지하 선열이 시대에게, 생자에게 던지는 물음에 우리는 대답해야 하며 또 한 번 그 뜻을 되새기는 유월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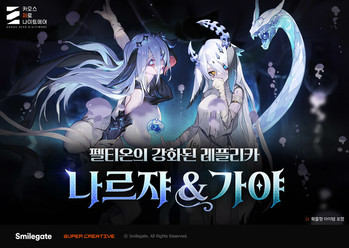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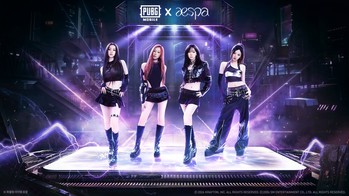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