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철원 논설위원 |
5월, 아카시아 향이 온 산을 덮은 빛 밝은 날, 한국 문단의 거목들이 약속이나 한 듯 차례로 생(生)을 졸(卒)했다. 이어령 교수, 한승헌 소설가, 이외수 소설가의 추도사가 아직 구천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김지하 시인의 부음이 벼락처럼 들려왔다. 가는 봄 끝자락에 그들이 묻혔다. 떠난 자들은 갔지만, 세상에는 이팝나무가 머리에 흰 눈을 뒤집어써 온통 꽃천지로 대지는 곱다. 그들의 치열했던 흔적은 죽음으로 승화되며 삶의 소임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긴 흔적은 그들이 죽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시인 김지하, 유신 시절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1970년대 서슬이 시퍼런 지상은 유신독재 세상이었지만 어두운 지하 세계는 김지하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지하는 저항 지식인으로서 암울한 시대의 정신이었다. 그가 발표한 시의 예리함은 운동권의 체념과 절망을 단숨에 베어버렸고, 민중의 타는 목마른 갈증을 한순간에 날려 보냈다. 엄혹한 시대 서민의 땀과 눈물을 착취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기득권층을 오적(五賊)으로 빗대 발표되자 세상은 아수라가 되었다. 그들과 손을 잡고 기생하며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어용지식인들은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니지 못했다.
이윽고 지하 세계에서 지상 세상으로 나온 김지하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가 가는 곳은 민주주의의 길이 되었고, 머무는 곳에는 저항의 산실이 되고 발화의 진원지였다. 시인의 시는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민주주의 상징 깃발로 펄럭이었다. 지식인들은 시를 읽고 스스로를 여미고 행동했고, 타고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키는 청량제 역할을 하였다.
김지하 시인은 유신 독재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다. 시인은 공(功)이 너무도 찬란했지만 과(過) 또한 컸다. 은둔 생활을 하며 생명 사상에 심취한 그는 시국에 항거하는 학생, 노동자들의 분실 자살을 보며 신문에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부재로 쓴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은 세상과 운동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박근혜를 지지하며 보수 성향으로 변신도 하였다.
70년대의 투사의 신화가 무너지자 한때 그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와 벗들은 치가 떨리는 분노와 노여움으로 그에게 따가운 눈빛을 보냈다. 생의 끝자락에 벗들로부터 변절자라는 오명을 쓴 시인의 죽음에 언론은 그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업적은 지면에 넘쳤지만, 그의 변절에는 침묵했다. 이제 죽음을 맞은 그에게 공과를 가르는 일은 다 부질없어 보인다.
작가 서해성은 죽은 지하와 산 지하를 함께 묻을 수밖에 없다며 추도 글을 이렇게 썼다. "지하는 산 지하, 죽은 지하가 하나 되어 떠나갔다. 분단과 군사독재 시대는 지하라는 피 끓는 모국어를 얻었고, 여전히 더 억압을 뚫고 가야 했던 울분에 찬 그 시대는 또 지하를 내쳐야 했다. 그는 맨 척후에서 거대한 모국어로 서슴없이 독재와 싸웠고, 끝나지 않은 저항 시대의 벗들과 불화했다. 지하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그의 모국어의 중심에 등재시킨 저 핏빛 황토의 언덕들이 그를 묻는다."
나는,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 비로소 죽음을 떠올린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다. 그 죽음의 불청객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올지 모른다. 죽음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삶은 죽지 않는 나를 미래 어디쯤 세워두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다. 일생의 완성이다."라고 했지만, 일생을 앞만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간혹 멈춰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장례식장행 티켓 매표소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돌아온 자는 없다. 의학 이론상 죽음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설명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른다. 신은 인간에게 생을 줬지만 멸도 곁들어 삶이 곧고 바르게 살라는 계시를 하였다.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지게에 자신의 삶이란 짐을 싸지고 죽음의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없다면 남은 자들이 그 짐을 헤쳐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잘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음, 멀쩡했던 영화배우 강수연이 심정지로 죽었다는 보도가 우리를 슬프게 했다. 많은 동료 배우와 영화인들이 죽음에 눈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떠난 자는 한마디 말이 없다. 영정사진 속 표정만이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남은 자들은 영령을 위로하기보다 떠난 자의 선한 영향력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죽어서만 죽는게 아니다. 살아서도 죽는 것이 있고 죽어서 사는 것도 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 전 죽음의 길을 생각해 볼 일이다. 나는 시대를 사는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살아서도 죽으며 살 것인가 잘 살아 죽어서도 부활해 영생할 것인가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모멘토 모리가 메아리처럼 귓전에 울린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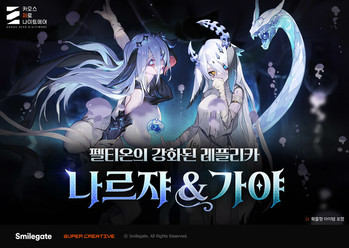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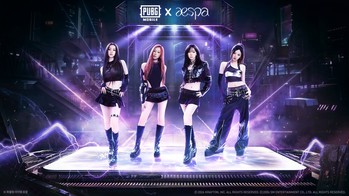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