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최지온
생각나는 건 별로 없었다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면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도 멈추지 않아
내가 영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둔 극장에서는/ 모든 게 멈춰있는 것 같아서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어깨를 조금 낮췄다
누군가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겹쳐있었다 심드렁해서 발을 꼬고
무릎을 맞댄 것처럼 영화는 흘러갔는데
월요일이었다 뚫어지게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몸이 무거워도 영화가 영화를 끝낼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깨를 낮춰도 상관없었다
그래도 볼 건 다 봤으니까
영화가 영화를 이끌고 가는 중이었다
 |
| ▲ 이은화 작가 |
“아무도 멈추지 않아서/ 내가 영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시 속의 나는 무기력한 관객으로 남을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을 들려준다. 하지만 삶은 영화처럼 흐르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스크린은 무채색을 띤 월요일, 나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자조적 해방감을 느낀다. 월요일이란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무거운 현실로 내밀리는 시간. 이처럼 주말의 휴식 뒤에 오는 월요일에는 불안이 숨어있다.
“그래도 볼 건 다 봤으니까/ 영화가 영화를 이끌고 가는 중이었다” 이 무심한 문장 속 나는 중심에서 조금 비켜서 있다. 반복되는 월요일의 다짐이 무너진 뒤,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청량한 거울 속 나를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나. 한 주의 시작이 버거울수록 천천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 커피 한 잔과 창밖 풍경과 새소리에 감각을 깨어보는 일. 어쩌면 이런 다짐은 의외로 가벼운 하루를 만날 지도 모르는 일.
월요일이 사라진다면 우리 일상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지만 끝과 시작은 계절처럼 지울 수도 건너뛸 수도 없는 일. 이렇게 반복되는 요일로 인해 자기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슬픔을 만날 때가 있다. 안개가 하루를 감싸고 있는 느낌처럼. 하지만 안개는 안개일 뿐. 그러므로 오늘은 휴일의 들뜸을 잠재우는 하루의 시작, 다시 월요일이다.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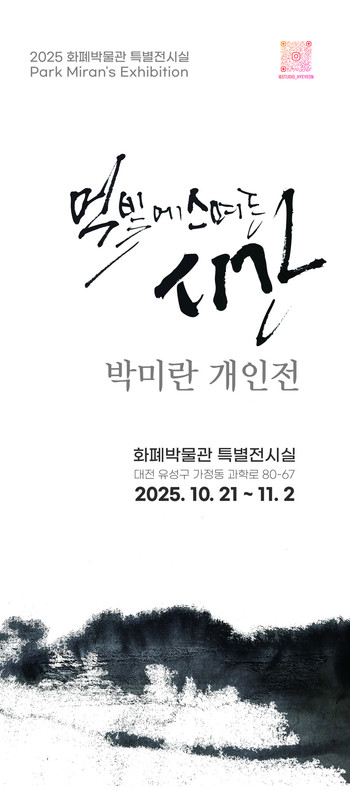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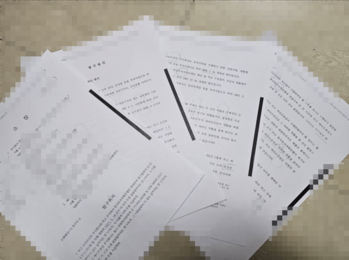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