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의 고독 2
이원
속옷만 입고 여자는 침대 한가운데에서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다
여자의 몸에 얼굴에 햇빛이 죽죽 그어진다
여자의 얼굴은 휴일의 상가처럼 텅 비었다
열린 창의 끝에서 흰 커튼이 양 갈래 머리처럼 흔들린다
여자의 등 뒤에는 벽 여자의 얼굴 앞에는 창
초록색 뿔테 안경을 쓴 남자 아이가 노인의 걸음걸이로 창밖을 지나간다
여자의 등이 점점 더 둥그렇게 휘며 벽에 가까워진다
뼈의 감정 같은 것
브래지어 버클보다 먼저 여자의 등을 물고 있던 살이 툭툭 터진다
뼈의 안쪽에서 뼈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고독이 꼭 추운 것만은 아니다
그물이 된 얼굴을 들고 여자의 뼈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
| ▲ 이은화 작가 |
창밖을 “초록 뿔테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노인의 걸음걸이로” 지나간다. 아이는 아이 같지 않고, 미래는 이미 늙음처럼 다가온다. 사람은 누구나 허리가 굽을 때까지 무언가에 마음을 기대고 살아간다. 사랑이든, 분노든, 혹은 오래된 슬픔이든. 언젠가는 결국 벽에 등을 기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표정으로 그 하루를 바라보고 있을까? 여자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을 닮았다. 매일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희망이든, 절망이든, 혹은 그 둘의 경계든 상관없다. 그 모든 것이 곧 우리의 얼굴일 테니까.
시인은 고독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뼈의 안쪽에서” 그 감정을 드러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독에 휘감길 때, 이 시는 그러한 순간에 읽기 적절하다. 누군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듯이, 감정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듯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마침내 알게 된다. 고독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솟는 침묵이라는 것을. 일요일의 고독은 나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틈이라는 것을.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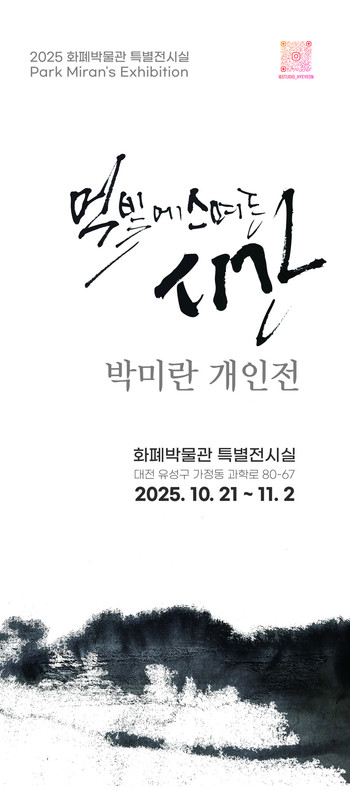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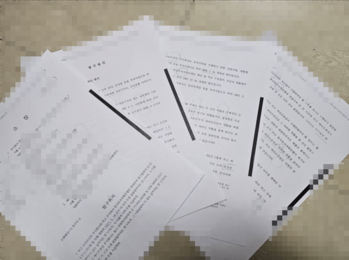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