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경복 편집위원 |
지도자가 사생관두(死生關頭)에서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역사적” 죽음이고 “고대사”의 죽음의 의미가 중차대하다. 그 이유는 역사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악용하거나 쉽사리 망각하기 때문이다. 타산지석이 되고도 남는 역사적 죽음을 통렬히 반추(反芻)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사의 고대사는 일반적으로 고조선 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가야 시대, 남북국시대, 후삼국 시대를 말한다. 2회에 걸쳐 기술하고자 한다.
낙랑이 고구려 소유로 되고 대방이 백제 소유로 돌아가자 대방 태수가 밀파한 자객에 의해 제10대 분서왕(汾西王)이 피살되었다.
부여의 의려왕이 즉위하고 41년만인 285년 선비 모용씨가 침입하여 도성 아사달(阿斯達)을 포위했을 때 방어하지 못할 것을 깨닫자 “망국한 죄를 국민 앞에 빌었고 태자 의라(依羅)에게 왕위를 넘기고 나라를 회복하라.”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국(殉國)한 왕이다. 부여의 부족장 회의는 수해(水災), 한해(旱災), 흉작(凶作)의 경우조차도 그 책임을 물어 왕을 바꾸거나 사형에 처했다.
동부여 금와왕의 장자 대소가 주몽의 묘연한 출생과 용맹성 때문에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후환을 당한다. 그러나 금와왕이 거부했다.
비류가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히 살 수 없어 다음으로 위례성으로 향했을 때 이미 온조는 편히 살고 있었다. 이를 목격하고 수치심을 느껴 자살하고야 말았다.
고구려 유리왕 9년(유리왕 28년), 부자간 불화로 국사상(國史上) 최초로 태자 해명(解明)을 자결하게 했다. 여진 동원 땅에 창을 꽂아놓고 말을 달리게 하여 창에 찔려 죽었다. 그래서 창원(槍原)이라고 이름 지었다.
대무신왕의 차비(次妃-갈사왕 손녀)의 소생으로 비정(非情)의 왕자 호동은 32년 11월 그의 뛰어남을 시기한 원비(元妃)의 참소로 왕의 의심을 받아 자결했다.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大武神王)은 대무신왕 2년 백제민 1천여 호가 귀부(歸附)해서 받아들이고 21, 22년 사이에 부여를 징벌하고 부여왕 괴유(怪由)가 부여왕 대소(帶素)를 죽였으나 싸움에는 대패했다. 왕을 잃고 부여는 혼란에 빠졌다. 대소의 아우 갈사(曷思)가 따로 압록곡(鴨淥谷)에 갈사국(葛思國)을 건설하자 대소의 종제(從弟)가 나머지 백성과 함께 고구려에 투항했다.
고구려 5대 모본왕(慕本王)은 사납고 어질지 못하고 포악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53년 11월 재위 6년 만에 시종 두로(杜魯)에게 시해되었다. 고구려 영류왕(營留王)은 수나라의 항전에서 수군(水軍)의 총수(總帥)로 활약하고 을지문덕과 고구려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개소문은 쿠데타로 영류왕을 시해한 천씨(泉氏)로 의표(儀表)가 씩씩하고 뛰어나며 의기가 강하고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성정(性情)이다.
백제 고이왕은 662년 1월 영(令)을 내려 모두 관리들이 부정한 재물을 수수하거나 도적질을 한 자는 3배의 장물(臟物)을 징수하게 하고 종신금고(終身禁錮)의 형벌을 처하게 했다.
고구려 9대 왕 고국천왕(故國川王)은 용맹과 관용을 갖추었다. 제나부(提那部) 우소(于素)의 딸, 우씨를 왕비로 맞았는데 왕비의 인척을 빙자한 좌가려(左可慮)가 권세를 잡아 저택을 빼앗고 양민의 자녀를 노비로 삼자 고국천왕이 죽이려 하자 사연나(四椽那)와 모반(謀反)을 일으켰다.
왕비 우씨(于氏)는 우리니라 역사상 정치에 관계한 최초의 왕비로 2대에 걸쳐 왕비 역할을 했다. 발기(發岐)는 왕의 위치를 동생인 연우(延優)에게 빼앗기자 군사를 일으켰으나 사람들이 따르지 않자 처자와 함께 요동으로 도망하여 요동 태수 공손도(公孫度)에게 3만을 빌어 고구려를 침입하여 산상왕은 동생인 계수(罽須))를 시켜 발기를 대패시키고 결국 발기는 계수의 훈계에 수치심을 느껴 자결했다.
고구려 차대왕을 시해한 명림답부(明臨答夫)는 172년 11월 한의 대군이 쳐들어 왔을 때 깊은 해자(垓字)를 파고 고루(高壘)를 쌓고 들판을 비우고 적의 피로함을 기다리고 기근에 시달리게 했다.
동천왕과 자기희생적인 충성스러운 밀우와는 달리 유유(紐由)가 자살하고 동천왕이 남옥저를 향해 도망치다 죽령에 이르렀다. 군사가 흩어지고 밀우(密友)가 혼자 왕을 시위했다. 밀우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추적군사와 싸웠다. 유옥구(劉屋句)가 밀우를 구해오자 왕은 무릎에 앉히고 소생시켰다. 유유는 위군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위장을 찔러 죽이고 자신은 자살했다. 왕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위군을 공격하여 패퇴시켰다.
신라의 박제상(朴堤上)이 눌지왕의 동생 두 불모를 구하자 왜왕(倭王)이 박제상을 목도(木島)로 귀향 보냈다가 얼마 안 되어 사람을 시켜 나무에 불을 질러 온몸을 태운 후 목을 베어 죽였다
수문제는 고구려를 징벌하기 위해 4차까지 추진하다 결국 강도(江都)에서 금위대(禁衛隊)의 반란으로 시해(弑害)당했다. 이연(李淵), 이세민(李世民) 부자의 반란으로 수도 장안(長安)을 빼앗기고 결국 수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 봉상왕(烽上王)은 즉위하자마자 왕제(王弟) 안국군(安國君) 달고를 죽였다. 적을 엄습해 격파하고 단로성(檀盧城)을 빼앗고 적의 족장을 죽였다. 시기심 많고 탐욕 호사스러웠다.
(다음에 계속)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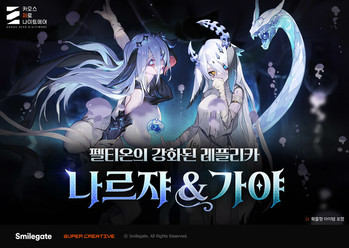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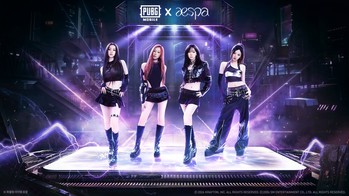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