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 ||
[일요주간=김해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선언했다.
트럼프의 선택은 녹색 성장(Green Growth)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 에너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어느정도 예고됐던 수순이었다.
미국의 '산업 르네상스'를 약속하고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부르짖는 전략으로 대역전승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제조업·건설업·에너지 분야 재벌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공화당 지지 세력인 재계, 특히 자동차 기업과 에너지·건설·군수 업계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해 당선에 일익을 담당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들에게 계속 '빚'을 갚아야만 하는 처지다.
세계 제1위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을 비롯해 독일,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비준국들이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퇴국이 줄지어 나온다거나 파리협정 체제가 아예 와해된다던가 하는 상황이 당장 벌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이번 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 구조를 수력, 풍력, 태양력,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려는 상황에서 미국만 화력발전 비율을 그대로 고수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등 기존 운송수단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먼 미래에는 첨단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고 '2등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의 진원지는 주로 전임 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이다.
지나 매카시 전 EPA 청장은 최근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현 정부가 청정 공기와 물, 토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간과하고 있고,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처를 주도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외교적 지렛대를 중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파리협정 협상 대표를 맡았던 토드 스턴 전 기후변화특사도 시사잡지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미국의 지도력으로 탄생한 파리협정을 미국 스스로 탈퇴하는 것은 세계의 분노와 실망, 혐오를 부르는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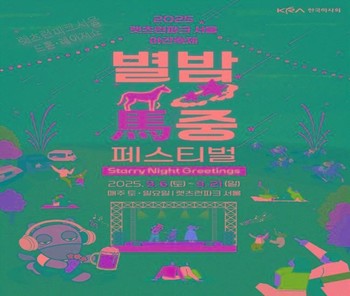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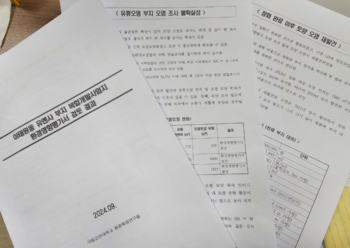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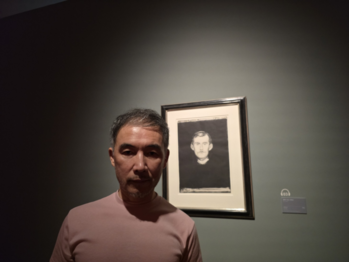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