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된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힘든 60고개를 넘다보니 아내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검진결과 다행히도 간단한 비뇨기 수술을 하면 된다는 주치의의 말에 안심되었다.
아내의 입원 첫 날 부터 불시에 홀아비가 된 나는 전기밥솥에 하루치 밥을 하여 국 대접에 물을 부어 꾹꾹 말아 묵은 김치를 걸쳐 대충 먹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몇 가지 음식 조리법이라도 배워 뒀으면 좋았으련만...
평소에 잔정 없는 사내라고 불평한 아내에게 속마음은 따뜻한 남편이라는 걸 보여 줄 심산으로 조석으로 아내에게 문안 전화를 하였다.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느냐’며 집안일과 내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하라고 위로하였다.
큰 병도 아니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내의 신신당부에 아이들도 모르게 나 홀로 병실 문을 드나들었다. 창백한 얼굴은 부어있었으며 링거를 꽂은 채 병상에 누어있는 아내가 측은하여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몇 마디 말을 나누고서 그만 병실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빨래 감은 쌓여가고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곳곳에 먼지투성이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옛말에 홀아비는 이가 *서말이란 격언이 내려 온지도 모르겠다. 아내 없는 집안에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홀아비가 되어보아야만 진정한 인생을 알고 심오한 종교를 찾게 된다고 했다던가? 애주가이신 선친의 18번! 노래가 생각난다. ‘인생이 살면 한오백년 사드란 말인가... ’ 술에 취하시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신 것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와 철없는 6남매를 홀로 먹여 살리신 가장의 책임감과 고뇌를 이제 서야 알 것 같다.
우리인생은 늘 세월에 속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 항상 젊은 청춘으로 한오백년 살 것만 같으나 어느새 아름다운 청춘은 늙어 주름살만 늘어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음이란 자기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산다. 회자정리(會者定離)란 말처럼 두 부부 중 누군가는 먼저 가야만 하는 슬픈 이별의 날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먼 훗날 남의 일로만 알고 지낼 뿐이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죽음이다.
요 며칠 전에도 지인의 부음장이 날아들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갈 나이가 아닌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다시 못 올 저 먼 나라로 훌쩍 떠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울어주는 자녀들과 부인의 소복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가급적이면 나도 아내 앞에서 먼저가야만 홀아비의 그 처절함을 면할 것 같다.
농기계 발명가 안사장을 만났다. 좋은 홀아비가 있으니 발이 넓은 나보고 중매를 서달라며 69세 된 건장한 분을 즉시 불러내었다. 12년간 아내의 병 수발을 한 모범된 가정생활을 한 그는 병든 아내가 가고 홀로되고 보니 밤이면 고독이 밀려와 밤잠을 이루는 게 고역이라고 했다.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며느리와 자녀들도 재혼을 권하여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이다.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 남은 황혼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기원해 주었다.
귀가 길에 아내의 입원실을 찾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 아내의 침상과 나란히 놓인 옆 침상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이형의 아내와 같이 한방을 쓰게 되어 말동무가 되어 주어 적적함을 덜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누가 볼 새라 조용히 병원 문을 열고나와 곧장 귀가 하였다. 아침에 해놓은 밥을 덜어 역시 김치와 대충 먹었다. 밤이 깊도록 서책과 시름하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를 잤는지 후둑후둑 함석 채양을 두드리는 소낙비에 새벽단잠을 깼다.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풍년농사를 기약하는 기분 좋은 비다.
한 주일이 번쩍 지나 오늘은 아내가 퇴원하는 날이다. 빨간 장미 몇 송이라도 안겨줄까 하다가 평소에 않던 넉살에 거북스러워 할까봐 정원에 갓 피어 난 아내가 좋아하는 옥색 물망초 꽃대와 넝쿨장미 몇 송이와 푸른 잎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동백나무 가지와 함께 식탁 화병에 가득 꽂아두었다.
따뜻한 모포와 윗옷을 챙겨 병원으로 곧장 갔다. 훌훌 털고 병원 문을 나선 아내의 창백한 얼굴에 금새 생기가 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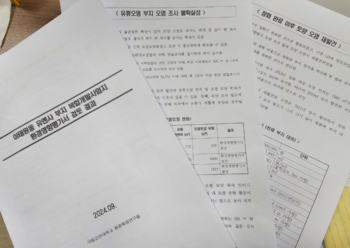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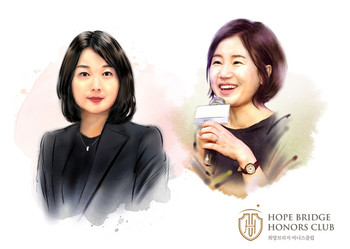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