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밥을 먹는 동안, 가까이 있던 것들이 멀어져갔네
종아리를 스치던 미루나무 우듬지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허공
비에 적신 머리채를 흔들거나 제 키보다 더 긴 그림자를 들었다가 놓네
소꿉친구는 기차를 타고 떠났네
화사花蛇가 벗어놓은 흰 허물
펄럭거리는 자리마다
푸른 잎을 부르는 석산화 울음 끝이 붉었네
청어를 사러 간 아버지는 둥근 집으로 들어간 후
대문의 빗장을 여우 콩 줄기로 닫아걸었다네
해질 무렵이면 청어를 굽는지 산자락이 자욱하네
씨앗 터지듯 몸을 뚫고 나온 아이들마저 더는 내 팔을 베고 잠에 들지 않는다네
수저를 들었다 놓으면서 한 모금씩 마신 물이
가슴 가득히 차올랐는지
이마에는 물결무늬가 새겨졌네
접속하지 못하는 내 안의 나마저 낯선 내가 되어 저만큼 앉아 있네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나와 가까이 있는 것들이 점점 멀어져가네
 |
| ▲ 이은화 작가 |
[일요주간 = 이은화 작가] ( 시 감상 ) 시인은 멀어져가는 것들을 애써 붙잡지 않는다. 다만 기록할 뿐이다. 멀어짐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밥을 먹는 일상처럼 찾아오기 것. 나무와 친구와 아버지 그리고 “씨앗 터지듯 몸을 뚫고 나온 아이들마저”도 제 속도로 자라나고 떠나가는 삶,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쓸쓸하다. 청어를 사러 나간 아버지가 들어간 ‘둥근 집’은 얼마나 절묘한 표현인가. 죽음을 이토록 부드럽게 그려낸 문장이라니. “여우 콩 줄기로” 걸어 잠근 빗장은 동화 속 주문 같지만 그 어떤 주문으로도 열 수 없는 문. 이 앞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마저 타인과 같다고 노래한다.
거울 속 낯선 얼굴처럼 “접속하지 못하는 내 안의 나”를 보며 기록하는 쓸쓸함이라니. 어쩌면 멀어진 것은 타인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 친밀했던 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던 내부의 나들이 아니었을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나와 어긋난 느낌. 매일 배를 채우면서 동시에 허기진 공허함처럼 말이다. 한때 익숙한 얼굴들이 희미해지듯 자신도 누군가에게 잊히고 멀어지는 것. 이렇듯 “멀어짐”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는 시인은 쓸쓸함의 무늬를 구체화해 옮겨놓는다. 이 시를 읽고 나면 밥을 먹을 때마다 무언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이마에 “물결무늬”를 새기며 다가오는 「쓸쓸한 생』의 노래처럼.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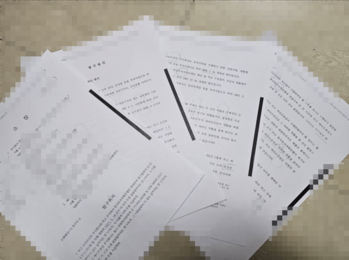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