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연화
박미라
물오른 것들의 소식이 밀려온다
꽃은 또 무엇 하러 피느냐고 어깃장을 놓아도 보지만
봄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핀다고
무심한 척 툭툭 터지거나 작정한 듯 우르르 피는데
그게 또 한결같이 곱디고와서
이름을 밝히기 싫은 봄꽃 한 가지를 꺾어 들고 걷다가
어디서 흘렸는지 까마득하다
그 꽃은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를 마저 피고 죽어갔을지
꽃을 좋아하는 어떤 바람이 쓸어 갔을지는 모르지만
바람은 어디쯤에서 꽃잎을 퉤, 뱉어 버렸거나
모둠발로 겅중거리며
너는 어디서 왔는지 정말 생각나지 않느냐고
뻔한 걸 묻다가 휙 돌아섰을지도 모른다
한철을 눈부시다 저무는 것들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자고
헛맹세 분분한 봄 햇살 아래에서/ 눈물도 꽃처럼 환하다
 |
| ▲ 이은화 작가 |
여기 꽃이 피는 제재를 담은 「화양연화」는 평생 한번 꽃 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봄꽃의 의지가 담긴 글이네요. ‘봄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핀다고/ 무심한 척 툭툭 터지거나 작정한 듯 우르르 피는데/ 그게 또 한결같이’ 곱다고 하는 화자는 ‘봄꽃 한 가지를 꺾어 들고 걷다가/ 어디서 흘렸는지 까마득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봄꽃의 행방을 잃은 화자는 꽃망울이 꽃을 피웠을까, 바람에 쓸려가진 않았을까, 잃어버린 꽃가지를 곰곰이 유추해 보지요. 그러다가 ‘한철을 눈부시다 저무는’ 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화자가 놓친 묘연한 아름다움은 지속될 수 없어 더 눈부시지 않았을까요.
화자가 읽어버린 꽃가지와 인생에서 가장 예뻤을 순간이 중첩되어 읽히는 시입니다. 인생을 봄날에 이입하는 시들은 애상적 내용이 많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봄날의 이별 시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머무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자연에 잠시 빌렸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름다움이 영원하다면 이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가치가 되겠지요. 흔한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는 시들고 미적 추구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시간을 이길 수 없듯이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주체는 시시각각 바뀌지요. 이 질서에서 오는 아쉬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날’을 희구하거나 되돌아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백 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가장 빛나던 순간을 맞은 꼼파이 세군도의 일화는 우리에게 희망의 꽃과 같은 삶입니다. 지금은 그의 노래 속에 잠들었지만, 애환을 예술로 승화시킨 노래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지요. ‘한철을 눈부시다 저무는 것들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자’는 화자의 마음은 반어가 아닐까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꼼파이 세군도처럼 빛나는 행복을 만나는 일, 곧 우리가 모두 희망하는 시적 순간일 거예요.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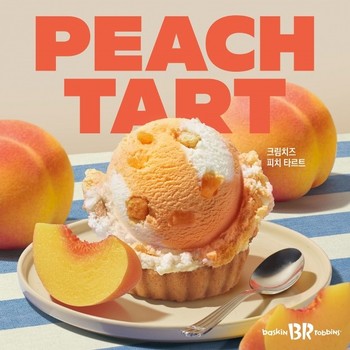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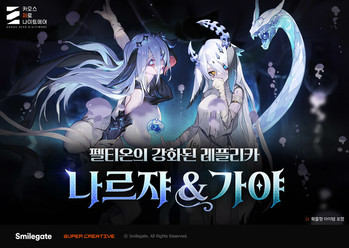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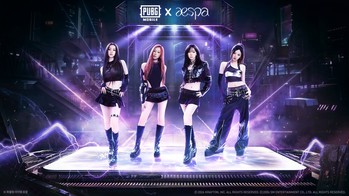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