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기택
새
김기택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중략>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 ▲ 이은화 작가 |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이인철 시인은 ‘부자는 자신이 쓰고 싶은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시간의 부자’라는 의미 여러분도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누군가의 아들과 남편 또는 아이의 아빠라는 이름, 잠시 내려놓고 하루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본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면 왠지 시간 속에서 가난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시. 오늘은 마음의 창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도 날개가 있잖아요.
1월과 2월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관을 열고 나갔지요. 십분 거리의 약국을 들리거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정도였어요. 잠깐 맡는 밖의 공기는 청량했지요. 차가운 햇살은 아름답고요.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자연이 허락한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슬퍼지던 때 「새」 읽으며 제 생활을 반영한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열심히’라는 뜻과 ‘잘살다’라는 뜻의 차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동안 일에 갇혀 주어진 환경에서 햇살과 공기를 음미만 할 뿐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요. 우리 핸드폰의 편리함을 줄이고 조금 불편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폰에서는 우리의 심상을 음미할 뿐 온전한 감각을 느낄 순 없으니까요. 서로 문명의 편리함에 익숙한 것은 아닐지 돌아볼 일이에요.
작가는 ‘새장 창문이 열려있다’고 말해요. 오늘은 딛는 자리가 허공일지라도 새장 밖으로 날개를 펴 노 젓듯 청량한 공기를 저어보는 건 어떨까요. 날고 싶어질 거예요.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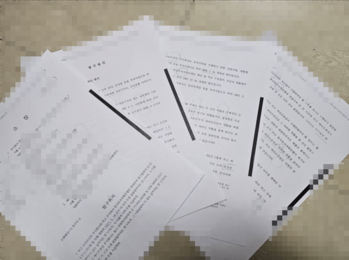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