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성현
서울의 낮은 언덕들
– 사물의 영역 12
박성현
당신은 시청 분수대 옆에 설치된 ‘서울의 낮은 언덕들’을 보고는 홀린 듯 멈춰 섰다
당신은 눈을 감고 점차책을 읽듯 손끝으로 하나씩 짚어 가기 시작한다 연두가 닿으면 숲이 열리고 자작나무가 닿으면 양피지에 옮겨 쓴 문자들이 열렸다
청동 파이프가 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곳에서 당신의 손가락도 직선과 수직으로 움직였다
골목을 걷다가 90°로 꺾일 때마다 새로 붙은 지느러미가 경쾌하게 파닥거렸다
 |
| ▲ 이은화 작가 |
‘점차책을 읽듯 손끝으로 하나씩 짚어 가’는 자리마다 ‘연두가 닿으면 숲이 열리고 자작나무가 닿으면 양피지에’ ‘문자들이 열린다’고 시인은 보여줍니다. 어둠 속 손가락에 의지해 읽어내는 ‘점자책’은 미지의 세계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삼라만상처럼 말이지요. 자작나무에서 양피지로 양피지에서 문자들로 옮겨가는 연상도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행의 모서리 깊은 골목에서 경쾌하게 파닥거리는 ‘새로 붙은’, ‘지느러미’에 순금의 리본을 달아주고 싶은 시간.
시집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에 실린 시인의 말에는 “아직, 해가 머물러 있다”(김종삼)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을 넘기며 만나는 해는 가끔 배꽃이나 달빛처럼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인에게 이 ‘해’가 시인 곁에 백 년은 머물 거라는 말을 전합니다. 사랑은 분홍이고 깊어지면 빨강이라, 우리 에너지를 모아 백 년은 거뜬히 헤엄칠 수 있을 테니까요.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은 빨강이란 뜻을 지닙니다. 햇볕에 말린 벽돌의 색깔에서 유래한 이름이지요. 달궈지며 단단해진 붉음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박성현 시인의 정서가 응축된 붉음이, 기쁨과 행복을 좇는 사람들에게 잠시 쉼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조금은 암울하고 조금은 들뜬 현대인들이 시인의 연금술 안에서 낯선 휴식을 만나보는 일, 자신만의 ‘연두’가 닿은 ‘숲’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삶에 지친 우리가, 오늘은 이런 숲 하나쯤 소중한 이름처럼 품고 살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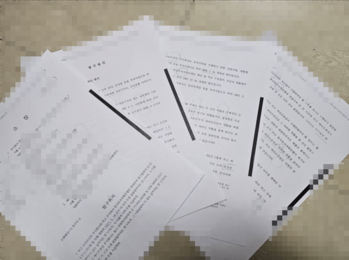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