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이해존
 |
| ▲ 이은화 작가 |
[일요주간 = 이은화 작가] (시 평론) ‘혼자 먹는 밥은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식탁에 앉아 엽서 몇 장 붙은 벽을 보며 먹는 밥, 숟가락 달그락대는 소리가 적막을 깨는 동안 벽의 얼룩은 수시로 무늬를 바꿨다. 춤으로 보였다가 또는 문자로 변하고 어느 때는 흐린 지도로 보였다. 벽을 마주보고 먹는 밥은 사막이나 밀림에서 생존을 위해 먹는 것처럼 위를 채우는 행위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정신적 포만감에 늘 굶주렸다. 또한 밤이면 적막을 깨기 위해 티비 볼륨을 낮춘 채 잠을 청하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로움은 사치라고 여기던 날들이었다.
『당신이 건넨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다』에 실린 이해존 시인의 「경건한 식사」를 읽은 뒤 식탁의 사생활을 들킨 기분은 비단 나만 갖는 마음이 아닐 것이다. 이는 「경건한 식사」를 읽는 우리 중 몇 집 건너 쉽게 만날 수 있는 저녁 식사 모습과 가깝기 때문이다.
담담하게 들려주는 「경건한 식사」는 눈 감고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읽힌다. 현관을 닫는 순간 소통이 단절되고 사면이 벽이 되는 공간에서 화자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나도 가끔씩 조잘’거린다. 이어 ‘지금은 사실과 농담이 필요’하다며 혼자서 ‘비스듬히 티비를 보고 벽을’ 본다는 자기 진술을 전한다. 이런 모습에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시적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이거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
작가의 객관적 대리인인 화자를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는 이 시의 주제가 현대인의 식사 모습과 닮아 있으며, 가깝게는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한 이유이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시는 우리가 묵는 처소가 공간적 개념이 아닌 온기가 있는 집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의미를 되묻게 한다. 이 물음 앞에서 이해존 시인의 「경건한 식사」는 제목부터 숙연해진다. 시를 읽으며 봄내음 수북하게 떠먹는 밥상을 떠올린다. 화자의 방이 더 쓸쓸해지는 저녁이다.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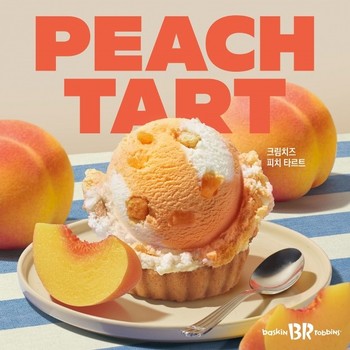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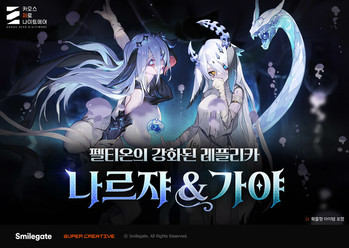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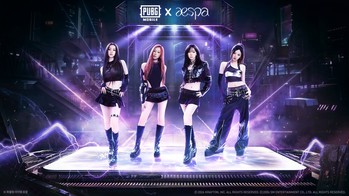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