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함민복
 |
| ▲ 이은화 작가 |
부부 연을 맺고 사는 동안 우리 파랑을 겪으며 연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웨딩 반지를 끼웠다 빼는 일 반복하며 잃었을 부부의 첫 마음을 일깨우는 시. 「부부」는 함민복 시인이 이웃 청년의 주례를 서 주던 주례사를 시로 옮긴 내용이라고 합니다.
부부란 밥상을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인은 삶의 고비를 ‘좁은 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하고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서로 높이도 조절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깍듯이 공경하다는 뜻이 담긴 거안제미가 떠오릅니다.
시인의 산문집 『길들은 다 일가친척이다』 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아름에 들 수 없어 둘이 같이 들어야 하는 긴 상이 있다/ 오늘 팔을 뻗어 상을 같이 들어야 할 두 사람이 여기 있다/ 조심조심 씩씩하게 상을 맞들고 가야 할 그대들/ 상 위에는 상큼하고 푸른 봄나물만 놓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뜨거운 찌개 매운 음식 무거운 그릇도 올려질 것이다// 중략// 팔 힘이 아닌 마음으로 상을 같이 들고 간다면/ 어딘들, 무엇인들, 못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 이 문장은 함민복 시인의 주례 내용 일부로 「부부」에 담기지 않은 부분입니다. 에세이에 담긴 내용 또한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네요.
‘夫婦’, 한자의 뜻은 다르지만 동음인 ‘부부’의 발음은 부드럽습니다. 목화솜처럼 포근합니다. 맹자의 부부유별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본분을 잘 헤아려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다고 해요. 부부란 보폭과 힘의 세기를 조율하며 발을 맞춰 걷는 사이, 이를 두고 수평적 관계라는 의미로 부부유별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말랑말랑한 힘』에 실린 「부부」를 소리 내어 가만가만 읽어봅니다. 입가에 번지는 웃음, 비단 물결이 입니다. 봄 오는 소리 들리는 듯 밖이 소란스럽네요.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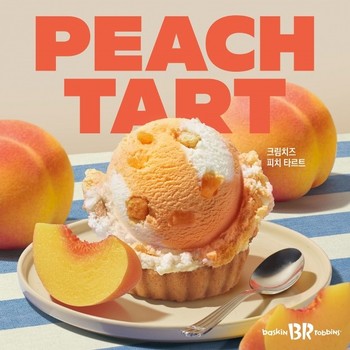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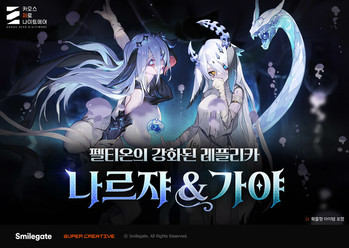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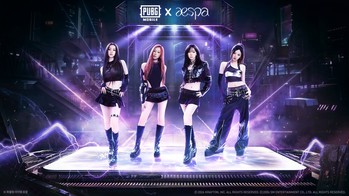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