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학
중년 여인 둘이서 자식 같은 개를 데리고 비탈길을 내려왔다 커브 길 담장에 장미가 들쭉날쭉 봉오리를 내밀었다 볼록거울 꽃무늬 접시 반지르르해지고 일찍 찾아온 땡볕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자잘한 금속이 소멸한 별빛을 대신했다 손안에 자꾸 비지땀이 차올라 반바지 흰 줄에 문대기 바빴다 무음의 핸드폰과 개 목줄을 바꿔 잡고 자기 가슴과 상대의 등을 치면서 눈곱 대신 다이아가 분출하는 웃음이 이어졌다 (글 이윤학)
 |
| ▲ 이은화 작가 |
시집 『곁에 머무는 느낌』에 실린 「첫 장미」는 ‘첫’이라는 관형사를 통해 장미에 대한 의미를 제한한다. 그러나 ‘첫’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설렘과 낯선 긴장감을 주는 어휘이다. 이윤학 시인의 시들은 「첫 장미」처럼 수사를 허락하지 않는다. 행간 속 상황묘사를 통해 구체적 행위를 보여줄 뿐. 이런 이유로 한 줄의 진술을 뛰어넘는 이 시의 묘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독자는 투수의 공을 따라가듯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어쩌면 이런 긴장감이 이윤학 시인의 시를 읽는 매력일 것이다.
중년에 접어든 두 여인은 어떤 관계일까, 시인은 궁금증을 유발할 뿐 끝내 보여주지 않는다. ‘자식 같은 개를 데리고’라는 행간을 통해 쌍둥이나, 자매, 또는 오랜 친구일 것이라 유추할 뿐이다. 이어 ‘자기 가슴과 상대의 등을 치면서’ 걷는 모습은 무언극처럼 읽힌다. 중년 여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는 없지만 ‘다이아가 분출하는 웃음이 이어졌다’라는 서사를 통해 즐거운 얘기를 나누며 걷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첫 장미」의 풍경은 우리가 꿈꾸는 중년의 자화상이 아닐까. 비록 내려온 길이 ‘비탈길’이지만 ‘다이아 웃음을 분출하며’ 걷는 길이라니!
장미는 여러해살이 식물이지만, 매년 봄에 피우는 꽃은 모두 ‘첫’에 해당한다. 이렇듯 우리가 맞는 아침 또한 시작인 ‘첫’과 같다면 두 중년이 맞는 매 순간을 처음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관습적 표현으로 계절을 인생에 빗대면 중년은 가을이다. 그러나 시인은 중년의 모습을 봄이라는 계절에 담고 있다. 그것도 강조하여 ’첫‘이라고. 시인은 두 중년의 행복한 모습을 「첫 장미」라는 제목으로 피워낸 것이다.
정서를 직접 표출하지 않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윤학 시인의 「첫 장미」는 한 편의 디카 시처럼 읽힌다. 이 시에는 분출되는 웃음만 있을 뿐 아픔과 슬픔은 없다. 그러나 인생에 왜 굴곡이 없겠는가. 두 중년이 걷는 커브 길의 비탈 볼록거울을 꽃무늬 접시로 치환하는 행을 통해 우리는 시인의 긍정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의 짧은 시 안에 담긴 중년의 모습은 ‘첫’ 안에서 입체적인 아름다운 시로 읽혔다.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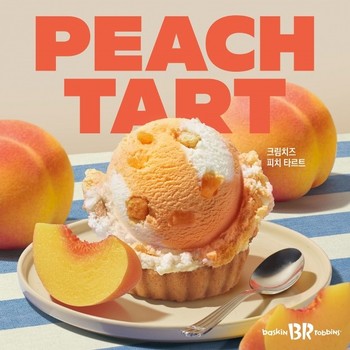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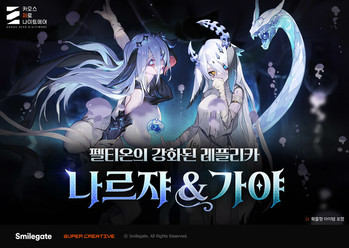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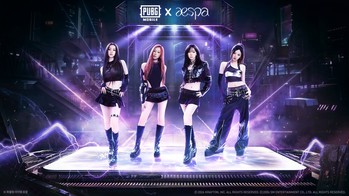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