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이생진
잠자는 산
이생진
오늘은 산이 잠자는 아이 같다
푸른 이불에 빨간 베개
내가 헛기침을 하며 지나도 깨지 않는다
누구하고 놀았기에 저렇게 피곤할까
산이 자고 있으니 내가 더 외로워진다
 |
| ▲ 이은화 작가 |
그동안 잠에 대한 감사보다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아쉬움이 남는 시간. 밤마다 알람을 맞추며 넉넉하지 못한 잠을 청할 때가 많았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누울 때면 섬처럼 쓸쓸하게 느껴지는 잠.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몇 차례나 나비잠을 자 보았을까. 돌아보면 크고 작은 근심으로 편한 잠을 만나지 못한 날들.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란 실줄 날줄로 원단을 짜는 것과 같아, 우리는 오늘도 베틀 앞에 앉아 자본의 노동요를 부르겠지. 그러나 안으로는 힘이 되고 밖으로는 허물을 덮어 줄 가족들을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잠.
할머니는 등에 산을 지고 사는 꼽추처럼 바로 눕지 못하고 웅크린 채 잠을 청할 때가 많았다. 반듯하게 몸을 뉠 때면 아이고! 아이고! 신음을 여음구처럼 내뱉던 할머니. 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두 다리 쭉 펴고 평평한 잠에 들던. 반듯하게 몸 뉠 수 있어 편하시겠구나, 나는 할머니 여윈 슬픔을 억지스레 위로하고는 했다.
보리순 차를 마신다. 보리순, 나비잠처럼 어여쁜 말이다. 순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소설가 김유정의 언어들이 떠오른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알싸한 웃음으로 끌어낸 그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한 인물이다. 그의 소설에는 한자어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말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애기」라는 소설에서 사전에 없던 ‘뽀뽀’라는 어휘를 처음 쓴 김유정의 글을 다시 읽으며 고운 우리말을 구사하고 싶은 욕심과 함께 다이어리를 넘긴다. 종이에 할머니 제삿날과 소중한 이들의 생일을 또박또박 적어본다. 나비잠이라는 이름과 함께.
지구 안의 모든 사람이 나비잠 잘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배냇저고리를 입은 아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순하고 맑은 잠, 심장 뛰듯 설레는 잠. 훨훨 날며 사랑하는 이들과 날개를 포개는 잠 만나기를. 소란스러운 봄, 우리 곁을 지키는 시간이 심심하도록 오늘 밤은 우리 모두 나비잠에 빠져 아이처럼 웃음 짓게 되기를.
※ 이은화 서울예술대학 졸업. 시집 『타인과 마리오네트 사이』가 있음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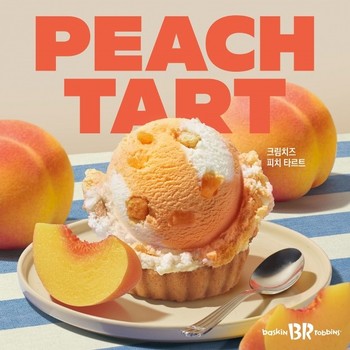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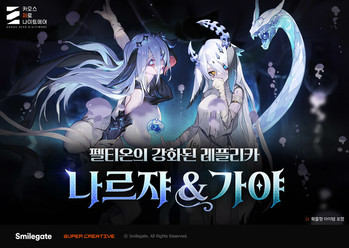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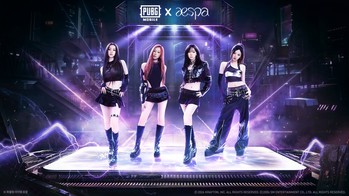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